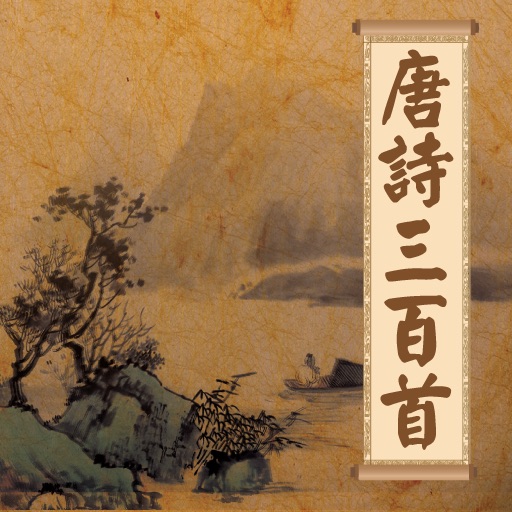
1.題目 作者 原文 解釋
| 99寄左省杜拾遺〈門下省 杜拾遺에게 부치다〉-岑參(잠삼) |
聯步趨丹陛 分曹限紫微.
나란히 종종걸음 붉은 계단 오르는데, 나누어진 관서 자미성으로 경계 지웠네.
曉隨天仗入 暮惹御香歸.
새벽에는 궁궐의 호위대 따라 들어가고, 저물녘에는 대궐의 향에 젖어 돌아오지.
白髮悲花落 靑雲羨鳥飛.
백발에 꽃이 떨어짐을 슬퍼하고, 청운 속에서 새 날아가는 것이 부럽도다.
聖朝無闕事 自覺諫書稀.
성스러운 조정엔 잘못하는 일이 없어, 諫言하는 글이 적음을 절로 알겠구나.
2.通釋
그대와 함께 조정에 들어갔을 때, 그대는 左署에 나는 右曹에 있고 그 중간에는 紫微省이 가로막고 있었지요.
이른 새벽이면 일제히 조정의 儀仗隊를 따라 들어가 天子를 배알하고, 저녁이면 온몸이 御爐의 향기에 젖어 돌아왔습니다.
늙어서 백발인 나는 꽃이 지는 것을 슬픔 속에서 바라보며, 靑雲 사이에서 새가 飛翔하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 새와 같았으면…….
지금과 같은 聖明의 조정에서는 過失이 없으니, 諫言하는 상소가 적은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3.解題
이 시는 肅宗 乾元 元年(758) 岑參이 44세였을 때, 左拾遺였던 杜甫에게 준 寄贈詩이다.
이때 잠삼은 右補闕을 맡고 있었으며 당시 杜甫, 賈至, 王維, 嚴武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출입하였다.
《杜工部集》에는 이 시에 杜甫가 唱和한 〈奉答岑參補闕見贈〉이 수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깊숙하고 맑은 궁궐,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은 같지 않다. 그대는 승상의 뒤를 따르고, 나는 日華門 동쪽으로 돌아온다. 늘어진 버들가지는 푸르고, 고운 꽃술은 붉기만 하구나. 친구는 좋은 詩句 얻어서 오직 백두옹 나에게만 주었네.[窈窕靑禁闥 罷朝歸不同 君隨丞相後 我往日華東 冉冉柳枝碧 娟娟花蕊紅 故人得佳句 獨贈白頭翁]”
잠삼이 이 시를 지을 당시 그는 得意한 처지가 아니었고, 杜甫 또한 房琯을 救濟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肅宗에게 미움을 사 오래도록 풀려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해 6월에 華州 司功參軍으로 폄직되어 조정을 떠났으니, 그 역시 똑같이 득의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잠삼(杜甫도 포함해서)이 벼슬길에 대해 갖는 희망을 노래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으며, 마지막 두 구인 ‘聖朝無闕事 自覺諫書稀’ 역시 聖朝를 향한 頌詞가 아닌, 寓意와 諷刺를 담고 있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杜甫 역시 그의 시 〈奉答岑參補闕見贈〉의 화답시에서 이러한 깊은 뜻을 잘 이해하고, 마지막 두 구에서 “친구는 좋은 詩句 얻어서 오직 백두옹 나에게만 주었네.”라 한 것이다. 이 시는 감정이 막힘없이 흐르면서도 이 같은 言外之意가 있기 때문에 詞意가 深婉하다고 평가받는다.
4.集評
○ 五六寓意深微 末二句語尤婉至
5‧6구는 寓意가 깊고 미묘하며, 마지막 두 구는 말이 더욱 완곡하고 지극하다.
聖朝旣以爲無闕 則諫書不得不稀矣 非頌語 乃憤語也 - 淸 紀昀의 말을 方回, 《瀛奎律髓》 卷2에서 인용
성인의 조정이라 이미 잘못이 없어서 간언하는 글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칭송하는 말이 아니라 분개하여 하는 말이다.
○ 能茹咽懷抱于筆墨之外 所以爲絶調 - 現代 吳汝綸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문장 밖에 부드럽게 함축시켰으니, 이 때문에 이 시가 훌륭한 것이다.
5.譯註
▶ 聯步趨丹陛 : 聯步는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것이다. 趨는 빨리 걷는 것인데, 공경의 뜻을 나타낸다. 丹陛는 계단 윗면을 붉게 칠한 것인데, 곧 궁전의 계단이다. 훗날 천자의 계단을 일컫는 말로 쓰였다. 여기서는 조정을 가리킨다.
▶ 分曹限紫微 : 分曹는 班을 나누어 일을 다스리는 관서이다. 岑參이 補闕이었는데, 中書省 소속이었고 右署에 거하였다. 杜甫는 拾遺였는데, 門下省 소속이었고 左署에 거하였다. 그러므로 分曹라 한 것이다. 限은 경계이다. 紫微는 꽃 이름인데, 唐나라 중서성에 紫微花를 많이 심었으므로 중서성을 자미성이라고 불렀다. 拾遺‧補闕이란, 황제가 무엇을 빠트리거나 잊었을 때 그것을 보충해준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관직명이다.
▶ 天仗 : 조정을 호위하는 儀仗이다. 《新唐書》 〈儀衛志〉에 “朝會할 때의 호위대가 다섯인데, 모두 칼을 차고 무기를 잡고서 동서의 廊廡 아래에 도열하였다.[朝會之仗有五 皆帶刀捉仗列於東西廊下]”고 하였다.
▶ 闕事 : 過失을 말한다.
6.引用
이 자료는 동양고전종합DB http://db.cyberseodang.or.kr/front/main/main.do 에서 인용하였습니다. 耽古樓主.
'당시300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01渡荊門送別〈荊門을 건너 송별하며〉-李白(이백) (0) | 2023.11.19 |
|---|---|
| 100贈孟浩然〈孟浩然에게 주다〉-李白(이백) (0) | 2023.11.19 |
| 98題破山寺後禪院〈破山寺 뒤에 있는 禪院을 읊다〉-常建(상건) (0) | 2023.11.19 |
| 97次北固山下〈北固山 아래 머물다〉-王灣(왕만) (0) | 2023.11.19 |
| 96題大庾嶺北驛〈大庾嶺 北驛에 쓰다〉-宋之問(송지문) (0) | 2023.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