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한국인의 살리고 싶은 버릇-35.한국인의 식사 문화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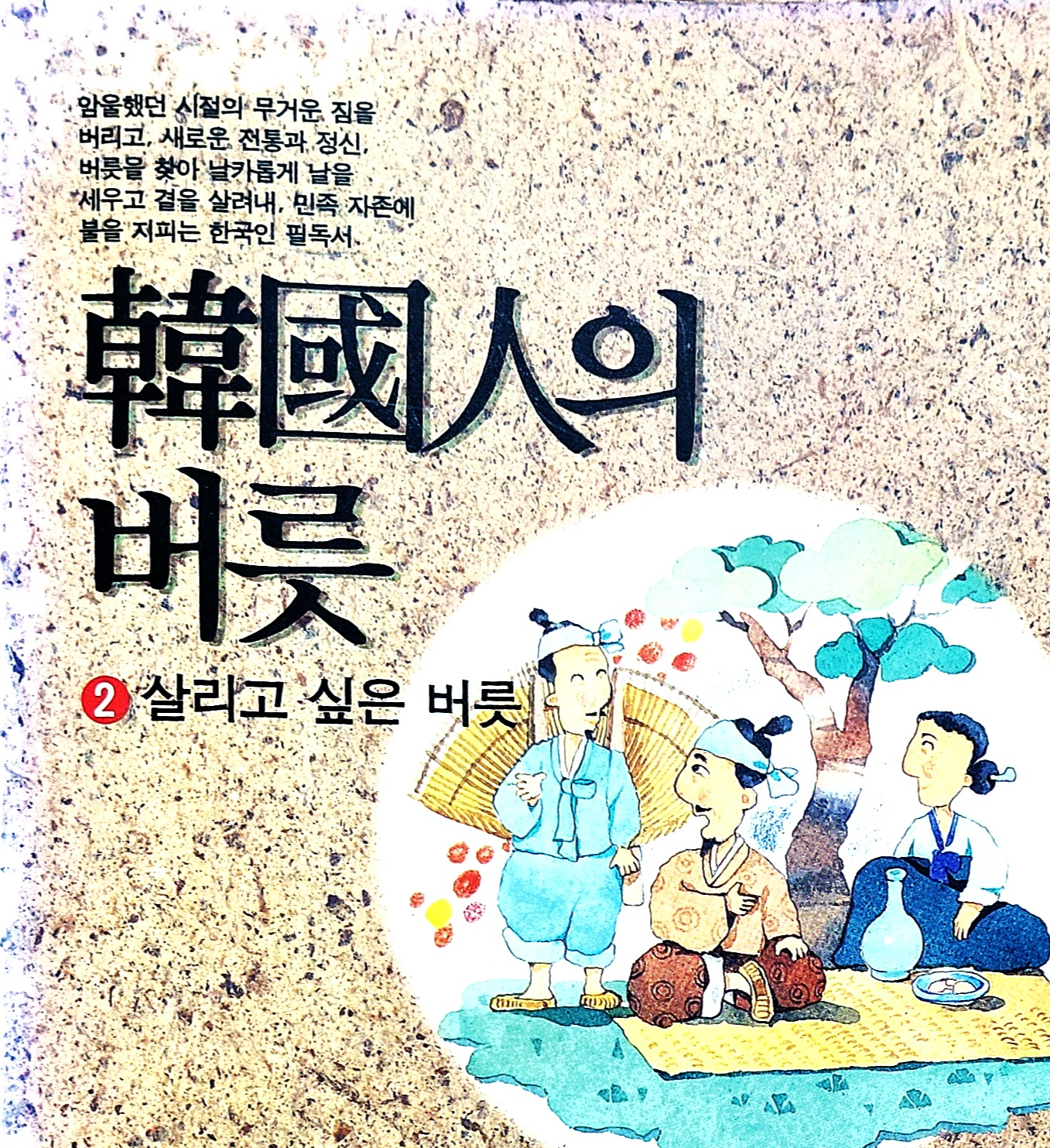
우리의 옛 선조들의 속담에 ‘따뜻한 밥이 고기 반찬이라...’ 햇듯이 음식이 따습다는 것은 반찬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여길 만큼 '온식(溫食)'에 가치를 두었던 것이다.
양식은 맨 처음 수프가 나오고 것을 먹고 난 다음 야채가 나오고, 그것을 먹고 난 다음 스테이크가 나오는 등 식사하는 구조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하나씩 나오고 그것을 먹어 치운 다음 다른 하나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 곧 시간계열형(時間系列型)으로 식사가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식사도 하나씩 먹어 치우는 시간계열형으로 구미와 같다. 일본도 맨 처음에 일반(一飯), 일즙(一汁), 일채(一菜)가 놓여진 밥상이 나오는 것은 한국과 같으나 그 후에 차례로 일선(一膳), 이선(二膳), 삼선(三膳)하는 독립된 요리가 차례로 배부된다는 점에서 시간계열형이 복합됐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 공기 다 먹고 두 공기째, 세 공기째 먹는 공기밥 자체도 시간계열형인 것이다.
이 같은 외국의 식사 구성에 비해 한국의 밥상은 모든 음식을 한 상에 차려서 내오는 공간전개형(空間展開型)이란 점에서 한국 식사 문화의 특색을 가려볼 수 있다.
따습게 먹기 위해 숭늉만 다 먹고 난 다음에 나올 뿐, 밥이며 국이며 김치며 찌개며 나물이며 한상에 모두 차려져 나오고, 그 공간 전개된 주식(主食)으로 식사를 끝낸다. 왜 한국의 식사 체계가 많은 외국의 시계형(時係型)과 달라야 했던가. 그 뿌리를 살펴보면 맨 먼저 한국의 밥상에 오르는 음식들이 각기 독립된 완벽한 식품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먹을 수 없는 상보적(相補的)인 복합 식품이란 데 있다고 본다. 서양 밥상에 오르는 요리, 중국 밥상에 오르는 요리는 각기 독립된 완벽한 식품으로 그것만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의 김치는 김치만을 먹을 수 없으며, 젓갈도 젓갈만을 먹을 수는 없다. 밥하고 김치하고, 밥하고 젓갈하고 복합 상보해서 먹을 수 있게끔 요리되어 있다. 물론 전야에 술을 많이 퍼마시고 해장을 해야 할 사람은 국물만 퍼마시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 밥상의 국물은 밥과 더불어 떠먹거나 밥을 국에 말아 먹는 상보적인 요리인 것이다.
한국 밥상에는 주식과 부식의 구별이 뚜렷하며 주부식을 복합시켜 먹어야 한다는 특성 때문에 더불어 먹어야 할 주부식을 한 공간에 전개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양식에는 주부식의 개념이 뚜렷하지는 않다. 빵이 주식이라는 생각은 ‘밥=곡물’이라는 적이 한국적인 발상이다. 오히려 고기를 주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주로 많이 먹는 음식이란 뜻에서 주식이지 한국의 식사처럼 밥을 먹기 위해 찬을 더불어 먹는 상보적인 의미의 주식과는 차원이 다르다. 영어에 부식의 뜻으로 Side dish란 말이 있으나 그것은 한국의 부식인 반찬과는 의미가 동떨어진다. 곧 음식에 있어 주부식이 확연한 것은 곧 공간전개형인 한국식사의 특성이라 해도 대과는 없을 것 같다.
곧 일기(一飢), 일온(一溫), 일채(一菜), 일장(一醬)해서 네 가지 반찬인 것이다.
우리의 옛 선조들이 속담에 ‘따뜻한 밥이 고기 반찬이라…’듯이 음식이 따습다는 것은 반찬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여길 만큼 '온식(溫食)'에 가치를 두었던 것이다. 요즈음은 김빠진 맥주란 말을 쓰지만 옛날에는 그 같은 경우, '식은 국'이라 했었다. 곧 차가운 음식은 음식으로서 가치가 반감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유목하는 쿠치족의 생활을 엿본 일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와 정반대의 냉식주의(冷食主義)였다.
보릿가루에 물을 부어 풀죽 쑤듯이 되게 끓인다. 다 익힌 다음에는 가죽주머니에 담아 인근 냇물에 넣어 충분히 식힌 다음 꺼내어 손으로 먹는다.
숟가락이나 젓가락 같은 식구(食具)를 쓰지 않고 손으로 먹어야 하기에 뜨거운 것을 일부러 식혀 먹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단순히 식구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온식(溫食)하고 냉식(冷食)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를테면 유럽 사람의 식탁에 오르는 요리는 우리 한국 밥상처럼 반드시 뜨거워야 한다는 법은 없다. 수프와 커피만은 뜨거워야 하지만, 그 밖의 요리들은 차지도 말아야 하지만 뜨거워서도 안 된다.
수프도 뜨거워야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국이나 찌개처럼 후후 불고 소리를 내지 않고는 먹을 수 없게끔 뜨거워서는 안된다. 양식을 먹는데 한국인이 느끼는 가장 큰 고역은 수프를 비롯, 국물을 마실 때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하는 식습관의 차이랄 것이다.
소리를 내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곧 그 음식이 뜨겁지 않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음식이 뜨거우면 중추신경은 입으로 하여금 그 뜨거움으로부터 감각을 보호하기 위해 조건반사를 일으키게 한다. 입술을 최대한으로 좁히게 하여 그 뜨거운 국물을 최소한으로 입에 들이킴으로써 열기의 대량 유입을 통제한다.
좁혀진 흡입 공간에 소량의 물질을 흡입하자면 소리가 나게 마련이다. 곧 한국인이 국물성의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는 것은 생리적 조건반사 때문이며 이것이 체질화되어 그리 뜨겁지 않은 국물을 마실 때라도 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
냉식문화권(冷食文化圈)에 속하는 구미 사람들은 소리를 내지 않아도 먹을 수 있기에 소리 내고 먹는 것이 에티켓에 위배되지만 온식문화권(溫食文化)에 속하는 한국 사람들은 소리를 내어 먹음직하게 먹는 것이 미덕이 되어 있는 것이다.
남도에 '소리 없이 밥 먹으면 말년에 굶어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소리 없이 밥 먹으면 도둑밥 먹는 것 같기도 한 어딘지 음험한 이미지 때문에 이와 같은 속담이 생겼을 것이다.
한국인이 조석으로 접하는 밥상과 서양 사람의 밥상을 비겨보면 한국인의 밥상이 얼마나 국물성인가를 알 수가 있다.
국이 그렇고 찌개가 그러하며 한국의 2대 기조 음식인 김치류와 장류도 거의 국물이 들어가 있다. 마른 반찬이 없는 것은 아니나, 밥상의 80~90 퍼센트 이상이 국물 음식이다.
따지고 보면 한국의 밥도 외국의 밥에 비겨 수분이 많은 습성 음식이다. 히말라야 등반 때 네팔 셰르파들이 지어온 밥을 먹어보면 마치 안남미(安南米) 밥처럼 찰기가 덜했다. 분명히 쌀은 안남미가 아닌 한국쌀과 비슷한데 찰기가 없는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그들 밥 짓는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들이 밥을 지을 때는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물을 많이 잡는다. 일단 그 물에 쌀을 익힌 다음 밥물을 모두 부어 없앤다. 솥이 큰 경우에는 대로 만든 용수를 박고 그 속에 괸 밥물을 낱낱이 퍼낸다. 이렇게 밥물을 퍼 없앤 다음 휘저어 놓고 다시 불을 때어 뜸을 들이는 것이다.
가급적 밥으로부터 수분을 제외하는 그런 방식으로 밥을 지었다. 이같은 음식 문화를 제수반문화(除水飯文化)라 하고 한국처럼 가급적 밥에 수분을 팽팽하게 먹는 취반문화(炊飯文化)를 함수반문화(含水飯文化)라 한다면, 세계적으로 미루어 보아 제수반문화권이 대부분이요, 함수반문화권은 한국과 일본에 국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한글 文章 > 살리고 싶은 버릇'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인의 살리고 싶은 버릇-37.鍊武를 겸한 유희 (0) | 2023.06.15 |
|---|---|
| 한국인의 살리고 싶은 버릇-36.5일장의 추억 (0) | 2023.06.15 |
| 한국인의 살리고 싶은 버릇-34. 국물 (0) | 2023.06.15 |
| 한국인의 살리고 싶은 버릇-33. 옷물림과 노란색 스웨터 (0) | 2023.06.15 |
| 한국인의 살리고 싶은 버릇-32. 많다 + α =푸짐하다 (0) | 2023.06.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