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태평한화골계전50-娼家抑揚之道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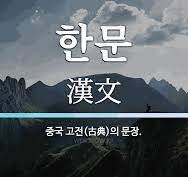
太平閑話滑稽傳
娼家抑揚之道
有文士姓孫者 奉使湖南.
孫氏 성의 文士가 湖南에 사신으로 갔다.
▶孫氏 성의 文士: ≪용재총화≫ (제6권)에 의하면, 이름이 孫永叔이다.
孫工文章 有藻鑑 湖南士子 學擧業者 爭持試卷 就求斤正 孫考閱品題 科目甚詳.
孫은 문장을 잘하고 문장을 감식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호남의 선비로 과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다투어 試卷을 가지고 와서 바로잡아 주기를 요구했는데, 孫은 考閱하고 품평하기를 조목조목 매우 자세히 했다.
▶藻鑑: 品藻와 鑑別을 말한다. 藻(조)는 마름을 뜻하나 무늬, 문채(文彩ㆍ文采)의 의미가 있다
▶試卷: '글장'이라고도 한다. 과거 시험 때 글을 지어 올린 종이, 혹은 글이 쓰여 있는 종이를 말한다.
▶考閱: 상세히 살피며 열람함.
羅州妓紫雲兒 性慧黠 奉使所情鍾者.
羅州 기생 紫雲兒는 타고난 눈치가 있으매, 봉사(奉使)가 무척 정(情)을 쏟은 사람이었다.
▶羅州: 나주목(羅州牧). 오늘날의 전라남도 나주다.
▶자운아: 기생의 이름이다. ≪용재총화≫ (제6권)에 의하면, 서울에서 생장해 梨園 제일부(第一部)에 속했으나, 죄를 지어 나주로 귀양 온 기생이다.
▶봉사: 奉命使臣의 준말로, 임금의 명령을 받고 다른 나라나 국내에 파견되는 관리를 말한다. 여기서는 손영숙을 가리킨다.
▶혜힐(慧黠): 슬기롭고 민첩(敏捷)함. 여기서는 문맥에 맞추어 '눈치가 있다'의 의미로 번역함. 黠: 약다. 영리하다
▶情鍾: 鍾에는 ‘주다, 부여하다(附與--)’의 의미가 있다.
一日 有宰樞姓趙 到羅州 兒亦薦枕.
하루는 趙氏 성의 宰樞가 나주에 오매, 자운아가 또한 잠자리 시중을 들게 되었다.
▶조씨 성을 가진 재추: ≪용재총화≫ (제6권)에 의하면 全州府尹 趙稚圭임을 알 수 있다.
▶薦枕: (첩이나 기생(妓生)ㆍ시녀들이) 잠자리에서 시중듦.
趙自恃風流文彩 語兒曰
兒平生狎客甚多
皮裏春秋自有袞鉞 如予者亦復何如?
趙는 스스로 풍류와 문채를 믿고 있었으매, 자운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지금까지 좋아한 사람이 매우 많았을 터이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속으로는 좋고 나쁨에 대해 스스로 엄정한 평가가 있을 터인데 나 같은 사람은 어떠하냐?”
兒曰
子可置次三等也
자운아가 말하였다.
“영감은 次三等에 둘 만합니다”
▶次三等: 글을 평가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다. 삼등(三等)의 다음이라는 뜻으로 합격권에 들지 못한 글을 가리키는 말이다.
趙驚曰
兒娼家何知吾文家之事
조가 놀라서 물었다.
“너 같은 娼家가 어떻게 우리 문사들의 일을 아느냐?”
兒曰
妾久從孫奉使 題品士子試卷 其滿篇圓珠 批點井井可觀者曰一等 次曰二等 次曰三等 其不入格者曰次三等 又其最下滿篇刪抹不用者曰更之更
자운아가 말하였다.
“제가 오랫동안 孫奉使께서 선비들의 시권을 품평함을 모셨는데, 글 전체가 둥근 구슬이 그득하고 批點으로 아로새겨져 가히 볼만한 것은 一等이라 하고, 그다음은 二等이라 하며, 그다음은 三等이라고 하고, 그 합격권에 들지 못한 것은 次三等이라고 하며, 또 그 格이 가장 낮아서 글 전체가 온통 고친 곳이고 쓸모가 없는 것은 更之更이라고 했습니다.”
▶孫奉使: 손영숙을 가리킨다.
▶圓珠: 글자나 시문(詩文)의 잘된 곳에 그리는 둥근 점을 말한다. 흔히는 貫珠라고 한다.
▶批點: 문장 가운데 문자의 요소나 묘한 표현 등의 오른쪽이나 위쪽에 찍는 점을 말한다. 따라서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刪抹: 깎다. 삭제하다. 지우다
▶更之更: 시문을 평가하는 등급에서, 등수에 들지 못하는 꼴찌.
《慵齋叢話 6》 最妙者爲上上․上中․上下, 其次爲二上․二中․二下, 又其次爲三上․三中․三下, 其不入品者, 次上․次中․次下, 最劣者爲更之更.
趙曰
孫奉使合置何列.
조가 물었다
“손봉사는 어느 줄에 둘 만하냐?”
兒曰
更之更也.
자운아가 말하였다.
“更之更입니다.”
趙幸居孫前 嫌在次三 頗有慙色.
조가 손보다 앞에 놓임은 다행으로 생각하면서도, 차삼등에 놓임을 싫어하여 자못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있었다.
兒迎解曰
前言戱爾.
子可居一等也 子寧知夫娼家抑揚之道乎.
今夫法家聽訟 屈抑訟者 縛縶之 笞朴之 庭辱百端.
徐徐解縛 召引使前 和顔溫語 其喜倍蓰 何則?
不縛而解 解者何功 不溺而援 援者何德.
先抑而後揚 先貶而後褒 此所以顚倒大丈夫者也.
자운아가 비위를 맞추어 해명하였다.
“아까 한 말은 농담일 뿐입니다.
영감은 일등에 놓일 만하니, 영감이 어찌 저 娼家에서 높이고 낮추는 방법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무릇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송사(訟事)를 들음에, 송사하는 사람을 억누르고 포승줄로 묶어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태(笞)로 볼기를 치는 등 관정(官庭)에서 온갖 욕을 보입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그 묶인 것을 풀어 주고 사또 앞으로 불러 앉혀서, 和樂한 얼굴과 따뜻한 말로 그 기쁨을 두 배나 다섯 배로 함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묶지 않고 풀어 준다면 풀어 줌이 무슨 공(功)이며, 물에 빠지지 않았는데 건져 준다면 건져 줌이 무슨 덕(德)이겠습니까?
먼저 억눌렀다가 뒤에 추켜 주며, 먼저 貶下하였다가 포상함, 이것이 대장부를 거꾸러뜨리는 방법입니다.”
▶笞: 태형(笞刑)을 가할 때 사용하는 刑具이다. 길이가 50cm 정도 되는 나무 막대기로 굵기는 손가락 정도 되는데, 이것으로 볼기를 치게 되어 있다.
▶倍蓰: 갑절 이상(以上) 댓 곱절 가량. 倍:곱절 蓰:다섯 곱절
《孟子·滕文公上》:「或相倍蓰,或相什佰。」
맹자집주 등문공장구 상 제4장
有爲神農之言者許行, 自楚之滕, 踵門而告文公曰:「遠方之人聞君行仁政, 願受一廛而爲氓.」신농씨의 학설을 전공하는 사람인 許行이 초나라에서 등나라로 가서, 궁궐의 문에 이르러 문공에
koahn.tistory.com
▶何則: =為何。多用于自問自答(자문자답할 때 주로 쓰인다)
《左傳·桓公六年》:“吾牲牷肥腯,粢盛豐備,何則不信?”
《史記·魯仲連鄒陽列傳》:諺曰:有白頭如新,傾蓋如故。何則?知與不知也。
列傳권83-魯仲連鄒陽列傳(노중련추양열전)
이 편은 齊의 魯仲連과 韓 鄒陽의 합전이며, 노중련은 전국시대 齊 사람(기원전305년경~기원전245년)으로 유세가이며 魯連이라고도 칭한다. 密陽 魯氏의 시조격이다. 秦이 趙를 공격하여 수도 邯
koahn.tistory.com
▶官庭: 官家 혹은 公判廷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후자의 뜻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듯하다.
趙大笑撫兒背曰
汝不是女中孫吳乎 何將略之多也
조가 크게 웃고 자운아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네가 바로 여자 가운데의 孫吳가 아니겠느냐? 어찌 그리 많은 꾀를 지녔느냐?"
▶孫吳: 중국의 유명한 병법가들이었던 孫子와 吳子를 말한다. 손자는 손무(孫武)를 존칭하거나, 혹은 그가 지은 책 ≪손자병법(孫子兵法)≫을 가리키는 말이다. 오자는 吳起를 존칭하거나, 혹은 그가 지은 책을 가리키는 말이다. 두 사람이 아주 유명하고 나란히 일컬어지기 때문에,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도 두 사람은 함께 입전(立傳)되어 있다.
'漢詩와 漢文 > 太平閑話滑稽傳'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태평한화골계전52-肯之以眉 (0) | 2024.12.08 |
|---|---|
| 태평한화골계전51-虎前乞肉 (0) | 2024.12.08 |
| 태평한화골계전48-大同江水何時盡 (0) | 2024.12.07 |
| 태평한화골계전47-娘大慙 (0) | 2024.12.07 |
| 태평한화골계전46-餘年稱貸 (0) | 2024.1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