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태평한화골계전48-大同江水何時盡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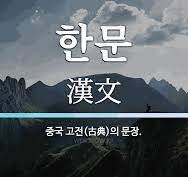
太平閑話滑稽傳
大同江水何時盡
大同江樓船 鄭諫議詩曰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大同江의 다락배에 鄭諫議가 시를 읊은 것이 있다.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비 갠 긴 둑에는 풀빛이 많은데 南浦에서 임 보내니 슬픈 노래 흐르네.)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대동강 물이 언제 마르리, 해마다 이별 눈물 더하는 것을.)
▶樓船: 다락배, 즉 다락이 있는 배를 말한다. 특별히 뱃놀이를 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鄭諫議: 정지상(鄭知常, ?~1135). 고려 때의 유명한 시인이자 문신이다. 그가 諫議大夫를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이다.
▶시: <送人>이라는 시로, 우리 漢詩史에서 뛰어난 작품 중 하나다.
金斯文爲民 嘗爲平安道經歷 秩滿將還 敎官金賢佐 送於大同江.
선비인 김위민(金爲民)이 일찍이 평안도 경력(經歷)이 되었다가 임기가 차서 장차 돌아가게 되니, 교관(敎官)인 김현좌(金賢佐)가 대동강에서 그를 송별했다.
▶金爲民: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조선왕조실록>에 그에 관한 기록이 있다.
▶經歷: 조선 시대에 충훈부(忠勳府)・의빈부(儀賓府)・義禁府・한성부(漢城)・中樞府・都摠府 등에 두었던 종사품 벼슬의 이름이다.
▶敎官: 교수관(敎授官)・훈도(訓導)・교도(敎導)를 통칭하는 말이다. 원래는 문과(文科) 출신 육품 이상을 교수로, 參外를 훈도관으로, 생원(生員)・進士를 교도로 삼도록 되어 있었다.
▶金賢佐: <조선왕조실록>에, 세종 8년 知德川郡事를 지낸 것으로 되어 있다.
妓浿江春 經歷所情鍾者 臨別痛哭 金情不自抑 涕淚沾襟 詠鄭詩曰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기생인 浿江春은 경력이 무척 정을 쏟았던 사람으로 이별에 임해 통곡하매, 김(金)이 스스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눈물로 옷깃을 적시면서 정(鄭)의 시를 외웠다.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대동강 물이 언제 마르리, 해마다 이별 눈물 더하는 것을)
▶浿江春: 기생의 이름이나 더 이상은 알 수 없다.
敎官從傍亦哭 金撫春背 執敎官手 又失聲痛哭曰
別淚年年添綠波 古人詩語 豈欺我哉
교관이 옆에서 또한 소리내어 우니, 김은 패강춘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교관의 손을 잡고, 또 소리를 내지 못하고 울며 말하였다.
“‘해마다 이별 눈물 더하는 것을'이라는 옛사람의 시구(詩句)가 어찌 나를 속이리요"
▶失聲: 悲極氣噎,哭不成聲者。2. 不自主地發出聲音。
語出《孟子·滕文公上》:“昔者孔子沒,三年之外,門人治任將歸,人揖於子貢,相向而哭,皆失聲。”
맹자집주 등문공장구 상 제4장
有爲神農之言者許行, 自楚之滕, 踵門而告文公曰: 「遠方之人聞君行仁政, 願受一廛而爲氓.」 신농씨의 학설을 전공하는 사람인 許行이 초나라에서 등나라로 가서, 궁궐의 문에 이르러 문공에게
koahn.tistory.com
竟自嗚咽不已 不忍辭去 傍觀者其指可掬.
마침내 스스로 흐느껴 그치지 않으며, 차마 작별하고 떠나지 못하는데, 옆에는 구경하는 사람이 그득했다.
▶指可掬: 대단히 많았다는 뜻이다. '지가국'은 '舟中之指可掬'에서 온 말이다. '패잔병들이 다투어 배에 오를 때에, 먼저 배에 탄 사람들이 나중에 배에 오르려는 사람들이 뱃전을 잡으면 그 손가락을 잘라 버려서, 배 안에 떨어진 잘린 손가락이 두 손으로 움켜질 정도로 많았다'는 내용으로, 원래는 패잔병의 모습을 형용하거나, 많다는 말이었다. ( 《左传·宣公十二年》 桓子不知所爲,鼓於軍中曰: “先濟者有賞!” 中軍·下軍爭舟, 舟中之指可掬也)
이 책에서는 문맥에 따라 단순히 많다는 뜻으로 보아 "그득하다"라고 번역한 것이다.
伶人崔禿頭 嘗於上前 呈此戱 上大笑.
광대(大)인 崔禿頭가 일찍이 임금님앞에서 이 광경을 보여드렸더니 임금님께서 크게 웃으셨다.
▶伶人: 廣大, 배우(俳優). 인형극・가면극 같은 연극이나 줄타기・땅재주 같은 곡예를 놀리는 사람, 또는 판소리를 하는 것을 업(業)으로 삼던 사람을 말한다. 신분상으로는 천민이었다.
▶최독두: 이 이야기에서 광대였다고 했으나 더 이상은 알 수 없다.
後吏曹薦金館職 上曰
此是大同江金爲民乎
뒷날 이조(吏曹)에서 김을 館職에 천거했더니 임금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바로 대동강의 그 김위민인가?"
▶館職: 홍문관이나 예문관의 벼슬자리를 말한다.
'漢詩와 漢文 > 太平閑話滑稽傳'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태평한화골계전51-虎前乞肉 (0) | 2024.12.08 |
|---|---|
| 태평한화골계전50-娼家抑揚之道 (1) | 2024.12.08 |
| 태평한화골계전47-娘大慙 (0) | 2024.12.07 |
| 태평한화골계전46-餘年稱貸 (0) | 2024.12.06 |
| 태평한화골계전45-許判書誠性執 (0) | 2024.1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