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태평한화골계전39-我是龍哥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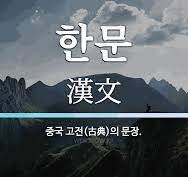
太平閑話滑稽傳
我是龍哥
衛士龍順雨 性癡直.
衛士인 龍順雨는 성질이 어리석었으나 정직했다.
▶衛士: 대궐이나 능(陵)・관아(官衙)・군영(軍營) 등을 지키는 장교를 말한다.
▶龍順雨: 이 이야기에서 위사라고 했으나 더이상은 알 수 없다.
嘗夜行遇巡官 潛伏橋下 是夜適以龍虎爲號.
언젠가 밤길을 가다가 巡官과 마주치자 다리 밑에 숨었는데, 마침 이날 밤 暗號가 '용(龍)'과 '호(虎)'였다.
▶巡官: 운영관(運領官)이라고도 한다. 운(運)을 통솔하는 관리라는 뜻이다. '運'은 야간에 순찰하는 入番軍士로서, 임시로 분대(分隊)한 단위이다.
▶潛伏: 야간통행금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순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숨었다는 말이다.
▶號: 암호, 또는 군호(軍號)다.
巡官禁人曰
龍哥
順雨以爲認己 遽出呈身.
순관이 지나가는 사람을 멈추게 하고 말하기를,
"용가(龍哥)“
라고 암호를 말했는데,
龍順雨는 순관이 자기를 알아보았다고 여기고 급히 나와 몸을 드러내었다.
▶哥는 세속에서 흔히 성의 뒤에 붙여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용가'는 '용씨(龍氏)'라는 말이 된다. 순관은 그날 밤의 암호가 ‘龍哥’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龍哥”라고 말한 것인데, 용순우는 그것이 암호인 줄 모르고 자신의 성인 '龍哥'로 오해했다는 말이다.
巡官曰
何人
順雨曰
我是龍哥
巡官笑遣之.
순관이
"웬 놈이냐?"
라고 하자, 龍順雨가
“제가 바로 龍哥입니다"
라고 하니, 순관이 웃고 그를 보내 주었다.
俗乃號愚者曰龍哥
그래서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을 '龍哥'라고 부르게 되었다.
順雨少名曰珊瑚 嘗於元日賀 百官排班 順雨亦持戟庭立.
龍順雨의 어렸을 때 이름은 산호(珊瑚)였는데, 정월 초하룻날 신년 하례(賀禮)를 올리느라고 벼슬아치들이 班列을 지어 있고 龍順雨 역시 창을 쥐고 뜰에 서 있었다.
▶班列: 벼슬아치의 품계의 차례를 말한다. 벼슬아치들이 조회(朝會)할 때 그 품계에 따라 배치되어 있는 品石 옆에 줄지어 섬을 말한다.
通禮唱山呼 順雨曰唯唯 滿庭皆笑之
通禮가 “山呼!”라고 불렀더니, 龍順雨가 “예, 예"라고 대답하고, 통례가 또 "山呼!"라고 불렀더니, 龍順雨가 또 "예"라고 대답하고, 통례가 또 “再山呼!"라고 불렀더니, 龍順雨가 "예, 예"라고 대답하매, 뜰에 가득했던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通禮: 조선 시대에 通禮院의 정삼품 벼슬의 이름으로, 좌우에 한 사람씩이 있었다. 여기서는 예식을 집행하는 관리를 말한 것이다.
▶山呼: '山呼萬歲'의 준말이다. 임금에게 경축하는 뜻으로 부르는 만세 구호이다.
▶여기서는 통례가 임금님께 대한 경축의 만세를 부르라는 뜻에서 山呼라고 한 것을, 순우는 자신의 어릴 적 이름인 ‘珊瑚’를 부르는 줄 알고 대답했다는 말이다.
▶예: 원문은 "唯"인데 이 경우는 '대답하다'의 뜻이다.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諾'보다 공손한 표현으로 인식된다.
▶밑줄 친 부분이 순암본에는 빠져 있다. 그대로도 문맥상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이 있는 것이 더욱 이야기를 재미있게 한다.
만송본에는 "通禮又唱呼順雨復曰 唯通禮又唱再山呼順雨曰 唯唯"라는 부분이 더 있고,
일사본에는 “又唱山號 順雨又日唯唯又唱再山呼 順雨日 唯唯”라는 부분이 더 있고,
민자본에는 "唱山呼 順雨又日唯唯又唱再山呼順雨"라는 부분이 더 있으므로,
여기서는 가장 이야기의 흐름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만송본에 따라 보충하고 번역하였다.
又順雨有奴曰嚴哲.
또 龍順雨에게 종이 있었는데 이름이 嚴哲이었다.
▶엄철: 이 이야기에서 용순우의 종이라고 했으나, 더 이상은 알 수 없다.
一日 車馬出宮外間辦嚴 順雨擐甲 出宮門疾呼嚴哲 掌鼓者以爲促嚴擊嚴鼓.
하루는 임금이 탄 수레가 출궁하여 밖에서 경비하는 중에, 龍順雨가 갑옷을 입고 궁문 밖으로 나가면서 큰 소리로 "엄철아!" 하고 불렀더니, 북을 관장하는 사람이 嚴鼓를 치라고 재촉한다고 여기고 엄고를 쳤다.
▶辦: 갖추다. 준비하다. 마련하다
▶嚴: 계엄(戒嚴), 경비(警備)
▶辦嚴:‘길 떠날 채비’를 말한다. 본래 ‘裝嚴’인데, 漢明帝의 諱를 피하여 辦嚴이 되었다고 한다.
▶擐甲: 갑옷을 입다
▶嚴鼓: 임금이 정전(正殿)에 출어(出御)할 때, 또는 거동 때에 엄숙함을 보이려고 百官과 시위군사(侍衛軍士)가 제자리에 대기시키기 위해서 치는 큰북을 말한다. 첫 번째 치는 것을 초엄(初嚴), 두 번째 치는 것을 이엄(二嚴), 세 번째 치는 것을 삼엄(三嚴)이라고 하는데, 이 세 번째의 북소리로 모든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되어 있었다.
▶여기서는 용순우가 자신의 종을 부른 말인 '엄철아!'를, 엄고를 관장하던 관리가 '嚴(鼓)를 쳐라!'라는 명령으로 잘못 알고 북을 울려서 문제가 되었다.
兵曹拿問 掌鼓者曰
順雨呼使擊之.
병조(兵曹)에서 붙들어다가 신문했더니, 掌鼓者가 말하였다.
“용순우가 북을 치라고 외쳤습니다”
問順雨曰
喚吾奴嚴哲 非促嚴也.
용순우에게 물었더니 순우가 말하였다.
“제 종인 엄철을 부른 것이지, 북을 치라고 재촉한 것이 아닙니다.”
盖哲與打方言相似 致此誤也
대개 ‘哲아!’와 ‘쳐라(打)!’의 우리나라 발음이 비슷하매,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이다.
'漢詩와 漢文 > 太平閑話滑稽傳'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태평한화골계전41-墮老賊術 (4) | 2024.12.05 |
|---|---|
| 태평한화골계전40-風聲鶴唳 (1) | 2024.12.05 |
| 태평한화골계전38-孟子是孔子之子 (0) | 2024.12.03 |
| 태평한화골계전37-報之以犬屎 (0) | 2024.12.01 |
| 태평한화골계전36-陞進運 (0) | 2024.1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