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태평한화골계전29.無患無其人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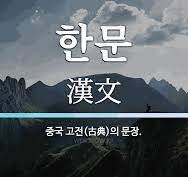
太平閑話滑稽傳
無患無其人
權承旨採有文名早歿 將軍金自雄 深嘆之.
承旨인 權採가 글을 잘하기로 이름이 났었는데 일찍 죽자, 장군 金自雄이 몹시 한탄했다.
▶承旨: 벼슬의 이름이다. 조선 시대에 承政院의 都承旨・左承旨・右承旨・左副承旨・右副承旨・同副承旨를 통틀어 일컫던 말이다.
▶權採[정종 1년(1399)~세종 20년(1438)]: 문신, 학자이다. 자는 여서(汝鋤),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우(遇)의 아들이자 양촌 권근(權近)의 조카이다.
▶ 金自雄: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세종 2년 3월 22일[경인(庚寅)]에 실시된 과거에서 부사직(副司直)으로 무과(武科)에 장원해서 사복 판관이 되었다. 세종 12년에는 호군(護軍), 세종 19년에 지창성군사(知昌城郡事), 세종 30년에는 경상좌도 도절제사를 지낸 것으로 되어 있다.
朴舍人以昌曰
子無患主文者之無其人.
牧隱逝而陽村主之 陽村逝而春亭主之 春亭逝而尹淸卿主之 淸卿逝權止齋主之.
止齋若逝南秀文主之 秀文若逝我亦在
我若逝將軍亦在 何患採之早逝乎
舍人 朴以昌이 말하였다.
"그대는 문장을 주관할 사람에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 근심하지 마라.
牧隱이 죽자 陽村이 주관했고, 양촌이 죽자 春亭이 주관했으며, 춘정이 죽자 尹淸卿이 그것을 주관했고, 청경이 죽자 權止齋가 주관했다.
만약 지재가 죽으면 南秀文이 주관할 터이요, 수문이 만약 죽으면 나 또한 있지 않은가?
내가 만약 죽으면 장군 또한 있는데, 어찌 權採가 일찍 죽었음을 근심하는가?"
▶사인: 벼슬 이름이다.
▶朴以昌[?~문종 1년(1451)]: 문신이다. 본관은 상주(尙州)로, 대제학 안신(安臣)의 아들이다.
▶牧隱: 이색[李穡, 고려 충숙왕 15년(1328)~조선 태조 5년(1396)]으로, '목은'이 호이다. 고려 말의 유명한 학자로 麗末三隱의 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陽村: 권근[權近, 고려 공민왕 1년(1352)~조선 태종 9년(1409)]). 조선 태조. 태종 때의 유명한 학자, 문신이었다. 자는 可遠 또는 思淑, '양촌'은 호이다.
▶春亭: [卞季良, 고려 공민왕 18년(1369)~조선 세종 12년(1430)]. 조선 초기의 학자, 문신이다. 자는 거경(巨卿), "춘정"은 호이다.
▶尹淸卿: 윤회[尹淮, 고려 우왕 6년(1380)~조선 세종 18년(1436)]. 조선 초기의 학자, 문신이다. "청경"은 자이다.
▶權止齋: [권제(權踶, 고려 우왕 13년(1387)~조선 세종 27년(1445)], 문신, 학자다. 자는 중의(仲義) 혹은 중안(仲安)이고, "止齋"는 호이다.
▶南秀文:[태종 8년(1408)~세종 25년(1443)]: 학자. 자는 경질(景質). 경소(景素), 호는 경제(敬齋), 본관은 고성(固城)이다. 참판 금(琴)의 아들이다.
▶主文者: 文衡, 곧 대제학(大提學)을 말한다. 홍문관이나 예문관의 우두머리로 품계는 정이품이나, 당대 제일의 문장가가 맡음이 관례이었다.
▶無其人: 오늘날 감각으로 '적임자가 없다' 정도로 이해함이 적절할 듯하다.
金然其論文章日就卑下之意 隱然言表
金自雄이 그럴듯하다고 여겼으나 그 논설은 '문장이 날로 낮아진다'라는 뜻을 은연중에 말로 나타낸 것이었다.
▶文章日就卑下: '날이 갈수록 대제학(大提學)의 문장 수준이 점차 낮아진다'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漢詩와 漢文 > 太平閑話滑稽傳'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태평한화골계전31-子先父齒者 (0) | 2024.11.28 |
|---|---|
| 태평한화골계전30-楡岾寺棟宇之制 (0) | 2024.11.28 |
| 태평한화골계전28-功名鷄卵客 (0) | 2024.11.26 |
| 태평한화골계전27-吾之門扉亦將倒 (1) | 2024.11.26 |
| 태평한화골계전26-何不買髥許我 (0) | 2024.1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