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唐詩 (初唐ㆍ盛唐)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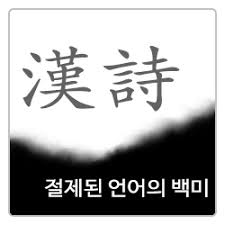
唐詩 (初唐 · 盛唐)
1. 당시 개관
漢 이래로 문학이 점차 발전하다 唐대에 이르러 중국문학은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漢文, 唐詩, 宋詞, 元曲이라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 장르는 바로 詩이다. 淸 康熙 연간에 나온 「全唐詩」에는 2,200여 시인이 만든 48,900여 수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 이는 西周부터 南北朝에 이르는 1,700년 동안에 나온 시의 3배에 달하는 수이다. 唐은 618년부터 906년까지 약 300여 년 동안 위세를 떨치다가 五代十國의 혼란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보통 당대 문학의 발전 시기는 初ㆍ盛ㆍ中ㆍ晩唐 의 4시기로 구분한다. 이는 明代 高棅의 「唐詩品彙」에 기록된 것을 따른 것으로 시 속에는 각 시기별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들이 반영되어 있다.
초당에서 성당까지 계속 이어진 태평성대는 시인들로 하여금 화려한 기교로써 국가의 번영이나 천자를 칭송하는 시를 짓게 하였으나 ‘안사의 난’을 계기로 하여 국력이 점점 쇠하게 되자 사회의 모순을 사실적으로 비판하거나 혹은 현실도피를 위한 관능적, 탐미적인 시작활동이 이루어졌다.
초당은 아직 唐詩의 틀이 정착되지 않은 시기로서, 남북조시대의 귀족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궁정문학이 발달하여 沈佺期, 宋之問에 이르러는 근체시를 이룩하게 된다.
성당에는 초당에서 완성된 시의 형식미와 표현기교에 다양한 제재와 내용이 결합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시가 창작되는데, 山水田園詩, 邊塞詩, 浪漫主義詩... 등 여러 형태의 詩派가 생겨나서 그야말로 唐詩의 절정기라 할 수 있다.
中唐은 ‘안사의 난’이라는 큰 혼란기를 겪은 직후의 시기로서 현실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平易한 시어로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를 짓자는 白居易의 ‘신악부운동’이나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자는 韓愈의 ‘고문운동’이 일어난다.
만당은 五代로 이어지는 사회적으로 무척 혼란한 시기였지만 기존의 문학풍조는 그대로 이어져 여전히 형식과 사조를 중시하였다.
※ 당시 발달의 중요 요인
① 정치 · 경제적 안정
당은 수의 멸망을 교훈 삼아 均田制와 租庸調法을 시행하여 사회경제를 안정시키려 노력했다. 그 결과 농업생산이 증가하고 각종 상공업이 발달하는 등 국력이 크게 신장되어 소시민층이 형성되고 그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② 다양한 사상의 보급
당의 정치 사회의 기본윤리는 유교였으나 국교처럼 존중되었던 것은 도교였다. 또한 불교가 들어와 인도의 불경이 번역되거나 많은 유적지를 남기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서역으로부터 景敎, 祅敎(요교), 摩尼敎, 回敎 등이 들어와 유행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종교의 발전이 사상의 폭을 넓혀 문학 발전에 일조하였다.
③ 과거제와 창작 주체계층의 확대
당대의 역대 제왕과 귀족들은 시를 무척 애호하였으며 科擧에서 詩賦를 평가함으로써 중하층 출신의 재주있는 문인들이 정치에 진출하고자 문학 창작활동에 힘썼다. 이로써 전에는 주로 관료나 귀족, 사대부에 의해 쓰여졌던 작품들이 당대에 들어서는 창작계층이 확대됨으로써 형식과 내용이 풍부해져 새로운 문학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④ 혼합 세계적 문화관
당은 국토 개척 정책을 통해 동서로 제국의 판도를 넓히고, 전쟁으로 개척된 육해 교통망으로 세계 여러 나라와 문화적 교류를 가졌다. 이 때 들어온 서역의 음악은 중국의 樂舞에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정부의 관료들이 남북지역이나 서역까지 멀리 유배 혹은 부임되면서 변방의 문화가 상호 교류되어 자연스레 사람들의 시야가 확대되고 세계적 문화관이 형성되었다.
2. 初唐 (618~712, 약95년)
(1) 시대적 배경
당 태종은 즉위 후, 정치의 안정과 사회의 번영을 통한 ‘貞觀之治’를 이룩하고
“짐은 武功을 통하여 천하를 평정했으나, 이제부터는 文德으로 海內를 편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國子學, 太學, 四門學 등을 설치하여 文敎를 크게 진작시켰다. 또한 태종은 왕조의 기초가 굳건해지자 자주 궁정에 연회를 열어 군신들과 함께 직접 육조풍의 궁체시를 지어 唱和하였다. 이러한 창화의 기풍은 날로 확산되어 당 초기의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宮廷詩파가 형성되었으나, 應制나 奉和시에 장중하고 典麗한 시구를 애용하는 등 육조 시풍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당 태종이 죽자 고종이 즉위하고 유신들이 황제를 잘 보좌하여 ‘永徽之治’를 이룩하였으나 얼마 못 가 황후 王씨가 폐위되고 태종의 후궁이었던 武씨가 황후로 들어오게 된다. 무후는 그동안 자신을 반대했던 전대의 명신들을 모두 제거하고, 점차 세력을 확장하여 조정에 분란을 일으키는데 그가 바로 則天武后이다. 이에 고종은 무후의 계략에 격분하여 上官儀와 함께 황후를 폐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역으로 상관의를 주살하게 된다.
이로써 측천무후의 아들인 中宗과 睿宗을 내세운 수렴청정의 시대가 도래한다. 측천무후는 무척 명민하였으며 태종과 마찬가지로 문학을 좋아하여 수많은 문인들을 곁에 두었는데 이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이 바로 초당사걸이다. 초당사걸은 남조의 시풍을 그대로 계승한 궁정시인들을 비판했고 그 뒤를 이어 진자앙이 복고를 주장하며 시풍을 개혁하려 하였다.
(2) 宮廷詩
상관의로 대표되는 궁정시는 齊ㆍ梁의 궁체시를 이어받아 화려한 형식으로 황제의 공덕을 칭송하는 시작활동을 펼치는데 이들의 작품은 모두 천자와 화답하는 응제 · 봉화의 형식적인 것들이었다.
上官儀(608~664는 자가 游韶이고 陝州 사람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형식의 오언시를 잘 지었다. 때로는 태종이 글을 지어 그에게 보일 정도로 그는 시에 일가견이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上官體’라 하며 본받으려 하였다. 그는 율시의 격률 완성에는 대단히 큰 공을 세웠지만 시의 내용은 대부분 보잘것없었다.
<入朝洛堤步月>
脈脈廣川流 넓은 강물은 도도히 흘러가고
驅馬歷長洲 말을 몰아 장주로 들어가네
鵲飛山月曙 아침 산달이 비치는 가운데 까치 날고
蟬噪野風秋 가을 들바람 부는 가운데 매미가 울고 있네
(3) 初唐四傑
상관의와 비슷한 시기에 유미주의를 계승하면서도 궁정시풍을 벗어나 시작활동을 한 초당사걸이 있었는데 왕발ㆍ양형ㆍ노조린ㆍ낙빈왕이 바로 그들이다.
당시 문단에서는 이들의 姓을 따서 ‘王楊盧駱’이라 불렀는데 양형은 ‘자신이 노조린의 앞에 있는 것이 부끄럽고, 왕발의 뒤에 있는 것이 수치스럽다’ 하였다. 이들은 모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으나 그 뜻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불우한 인생을 살다 대부분 요절하였다.
사걸은 육조의 형식주의 문풍을 한층 발전시켜 근체시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던 악부시에 주력했는데 특히 장편 칠언 가행은 양형을 제외한 사걸에 의해 중요한 시체로 자리잡게 된다.
① 왕발 (王勃, 647~675)
字는 子安이고 絳州 龍門인이다.
왕통의 손자로서 어려서부터 문장을 잘 지었고 17세에 이미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그 무렵 왕자들이 鬪鷄에 열중하여 서로 내기하는 것을 보고 장난삼아 문장을 지었다가 고종의 노여움을 사 쫓겨나게 된다. 그 뒤로 사천지방을 방랑하다 죄를 사면받고 다시 하위직을 얻게 된다. 그러나 죄지은 관노를 숨겨주었다가 일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만 죽이고 마는데, 나중에 이 일이 알려져 왕발은 간신히 목숨만 구하는 신세가 되고 그의 부친은 交趾, 지금의 베트남 북부로 좌천되고 만다. 왕발은 후에 그의 부친 소식을 듣고,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던 중, 물에 빠져 익사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王子安集」이 있으며, <騰王閣詩序>, <送杜少府之任蜀州>가 바로 그의 작품이다.
<送杜少府之任蜀州>
城闕輔三秦, 風煙望五津
與君離別意, 同是宦遊人
海內存知己, 天涯若比隣
無爲在岐路, 兒女共霑巾
三秦이 둘러싸고 있는 성궐에서 바람과 안개 가득한 五津을 바라본다
그대와 이별하는 뜻 각별함은 다 같이 벼슬하며 떠도는 사람이기 때문일세
천하에 지기만 있다면야 하늘 끝도 이웃과 같으리니
헤어지는 기로에서 아녀자 같이 눈물로 수건을 적시지 마세
* 三秦: 陝西省 일대를 뜻함
* 五津: 蜀지역. 四川省에 있는 5개의 나루
* 海內: 천하, 온 세상
* 宦遊人: 고향을 떠나 벼슬길을 나선 사람
② 양형 (楊炯, 650~692?)
양형은 華陰인으로 12세에 신동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校書郞이 되었고, 이후로도 여러 관직을 맡았다. 그는 성격이 독선적이고 오만하여 세인의 질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양노락’에서 자신이 왕발의 뒤에 있음을 따지며 자신의 문재를 자부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작품 수도 제일 적고 독창성이 부족하여 성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주로 변경생활과 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들 속에서 격앙된 정서를 잘 나타냈는데 그 중에서도 <從軍行>을 대표로 들 수 있다.
<從軍行>
烽火照西京, 心中自不平
牙璋辭鳳闕, 鐵騎繞龍城
雪暗凋旗畵, 風多雜鼓聲
寧爲百夫長, 勝作一書生
봉화가 서경에 비추이니 마음은 저절로 격앙되네
군사 이끌고 궁성 하직하고 가서 철갑 기병으로 용성을 포위하네
눈발 자욱하여 깃발 그림도 빛을 잃고 바람 요란한 중에 북소리 섞이네
차라리 백부장이 되는 것이 한 서생으로 사는 것보다 나으리
* 西京 : 長安
* 龍城 : 匈奴의 땅
* 百夫長 : 하위직 군관
③ 노조린 (盧照隣, 637~680)
자는 昇之이고 范陽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재질이 뛰어났고 후에 鄧王府의 문서를 관장하며 왕의 사랑을 받아 新都尉까지 올랐으나, 풍질에 걸려 손발이 마비되는 등 말년에 병으로 고생하였다. 그는 가산을 탕진한 채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다 결국 穎水에 몸을 던져 자살하였다. 노조린은 스스로를 幽憂子라 불렀는데 이러한 불우한 인생은 오히려 시의 정서를 깊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작품으로는 「幽憂子集」이 있으며, 부의 형식으로 장안의 허영을 비판한 장편 고시 <長安古意>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行路難> 이 유명하다.
<長安古意>
節物風光不相待, 桑田碧海須臾改
昔時金階白玉堂, 卽今惟見靑松在
寂寂廖廖揚子居, 年年歲歲一床書
獨有南山桂化發, 飛來飛去襲人裾
계절에 따른 풍경은 그대로 있지 않아 상전이 벽해로 변하는 것도 눈 깜박할 사이다
옛날의 황금계단과 백옥으로 만든 터에는 지금도 오직 푸른 소나무만 있을 뿐
적적하고 쓸쓸한 양웅의 집에는 해마다 책상에 가득한 책뿐인데
홀로 저 남산의 계화가 바람에 날려와 오고가며 사람들의 옷자락에 스친다
④ 낙빈왕 (駱賓王, 640?~684?)
낙빈왕은 婺州 義烏사람으로 7세 때부터 시를 쓸 수 있었던 신동이다. 일찍이 벼슬을 하였으나 측천무후에게 상소를 올렸다 도리어 좌천되고 서경업의 반란에 가담하게 된다. 이후 반란이 실패하자 그는 도망하여 자취를 감췄다. 그 역시 노조린과 함께 장편 가행에 뛰어났는데 <帝京篇>, <疇昔篇>은 특히 유명하며 시문집으로는 「駱賓王文集」, 「駱臨海集」 등 10권이 있다.
<在獄詠蟬>
西陸蟬聲唱, 南冠客思侵
那堪玄鬢影, 來對白頭吟
露重飛難進, 風多響易沈
無人信高潔, 誰爲表予心
가을날 매미 소리가 울려 퍼지니 감옥 속의 나로 하여금 더욱 수심에 잠기게 한다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검은 날개의 매미가 흰 머리의 나를 향하여 우는 것이다
이슬이 무거우니 날아오르기 어렵고 바람이 심하니 우는 소리도 가라앉기 쉽다
나의 고결함을 믿어주는 이가 없으니 누구에게 나의 마음을 고백하리요
* 西陸 :가을
* 南冠 :외지에서 감옥에 갇힌 것
* 那堪 :어찌 감당하랴?
* 玄鬢 :검은 머리
※ 이 시는 낙빈왕이 무후를 비판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안에서 매미의 우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결백함을 매미에 비유해 지은 것이다.
제1연은 매미소리에 수심이 깊어지는 도입과정이고, 제2연에서는 玄鬢과 白頭의 대비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효과적으로 살렸다. 제3연은 露와 風의 雙關法을 사용하여 시적효과를 배가 시켰다.
(4) 개성적인 시인들
초당의 유미주의 문학기풍 속에서 형식보다 내용에 치중하여 ‘漢魏風骨’의 개성적인 작품을 쓴 작가들이 몇 있었는데 王績, 王梵志, 陳子昻이 그들이다.
왕적은 왕통의 아우이며 관직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여 北山의 東皋에 은거하며 술 마시고 거문고 타며 일생을 보냈다. 왕적의 시는 도연명에 가까워 담담한 가운데 은일하는 심경을 노래하였고, 그에게는 「酒經」, 「酒譜」, 「醉鄕記」, 「無心子傳」,「東皋子集」등이 전해진다.
왕범지의 시는 당ㆍ송 때 유행하다 잘 전해지지 않았는데 敦煌 莫高窟의 藏書 발견으로 빛을 보게 되었다. 그 역시 불교신자로서 세상에 숨어 살며 소박한 삶을 자유로이 노래하였다.
진자앙은 17~8세가 되도록 글을 몰랐으나 어느 날 마을의 학교에 갔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공부에 전념하여 수년 동안 經史百家의 책을 모두 독파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그는 후에 초당의 시문이 남조 문학의 수사미에 빠져있다고 비판하며 시에는 興寄가 있고 骨肉이 있어야 하므로 육조를 거슬러 올라가 ‘漢魏風骨’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建安의 풍골을 계승하려 한 점에서 복고론자라 할 수 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38수의 <感遇詩>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政事에서 느낀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두보는 그의 시에 대해 “陳子昻은 揚雄ㆍ司馬相如 뒤에 태어났으나 이름은 해나 달처럼 뚜렷하네. …… 고금의 충의를 세웠으니 남겨놓은 시로 <감우시>가 있네.”라 평하였다.
<感遇詩>
蒼蒼丁零塞, 今古緬荒途
亭堠何摧兀, 暴骨無全軀
黃沙幙南起, 白日隱西隅
漢甲三十萬, 曾以事匈奴
但見沙場死, 誰憐塞上孤
푸르고 푸른 정령족이 사는 변경은 옛부터 아득히 멀고 거친 곳이네
보루는 어찌 이리 무너져 있나 널려 있는 뼈는 온전한 모습이란 없네
누런 모래먼지 자욱히 남쪽에 일어나자 밝은 해도 서쪽 구석으로 숨었는데
한나라 군사 30만이 옛날 흉노를 정벌하러 오던 때였네
오직 보이는 건 모래 위에 죽은 자 뿐이니 누가 변경의 고아를 보살펴줄 것인가
* 丁零塞 : 丁零이라는 종족이 사는 변경
* 緬 : 아득히 먼 것
* 亭堠 : 변경에서 망을 보는 보루
* 摧兀 : 험하게 무너져 있다
* 幙 : 漠과 통하여 자욱한 모양, 사막
※ 진자앙의 <感遇詩>는 총 38수로써, 작가가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느꼈던 세상에 대한 여러 감상들을 노래한 것이다. 위의 시는 38수 중, 제 3수로써 전쟁으로 인해 북방 변경이 얼마나 황량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5) 近體詩
1) 근체시의 발달
근체시란 중국의 고체시에 맞서는 개념으로 今體詩라고도 하며 句數, 平仄, 押韻 등의 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시를 말한다. 뜻을 위주로 하던 漢代의 시체가 점차 약해지며 기교로 흐르자 ‘四聲ㆍ八病說’로 대표되는 沈約 등에 의해 근체시의 성립이 촉구되었다. 종래에는 다만 무의식적으로 청각의 아름다움에 호소할 뿐이던 것이 일정한 규칙을 지향하여 음절의 배열이나 對句 등에 따라 오언과 칠언, 절구와 율시로 확립되었다. 우선 초당에서 상관의를 비롯한 궁정시인들이 육조시를 계승하여 형식적이고 유미주의적인 시를 짓다가 이것이 초당사걸의 시작활동을 통해 점차 근체 형식을 띠게 되었다. 이후 문장사우와 심전기, 송지문을 통해 육조의 시풍에서 탈피하여 성당에 이르러서는 수많은 작가와 다양한 풍격의 출현으로 중국문학사상 시의 전성기를 맞게 된다. 근체시에는 絶句와 律詩 그리고 排律이 있다. 절구는 4구로써 찰나적 감정을 응축시키는데 적절하며 군더더기가 없는 표현으로 오랫동안 여운을 남긴다. 오언절구는 六朝 말에 체제가 정비되었고, 칠언절구는 초당 말경에 자리 잡았다. 율시는 8구인데, 2구를 1연으로 하여 4연으로 되어 있다. 중간 2함련과 3경련은 對句를 쓰는 규칙이 있고, 平仄의 배열법은 절구와 같다. 배율은 율시보다 연이 더 많은 시를 말하는데 보통은 24구 정도가 많지만 그보다 더 많거나 적은 것도 있다.
(2) 근체시의 대표시인
① 文章四友
문장사우는 崔融과 杜審言, 蘇味道, 李嶠를 말한다. 이들은 모두 대신들로서 측천무후와 황제의 명을 받들어 글을 짓던 사람들로서 그들의 작품은 율시의 시형 발전에는 기여했으나 그 내용은 공허하고 보잘것없었다.
崔融(653~706)은 무후와 그가 총애하던 張易之에게 아부하며 문단의 중진이 되었지만 문학적 가치는 없었다.
杜審言(647~708)은 두보의 조부로서 오언시에 능했으나 자신의 재주를 믿고 오만하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蘇味道(648~705)는 李嶠(644~713)와 함께 문장으로 이름이 알려져 ‘蘇李’라 불리기도 하였다. 문장사우 중에서는 그나마 이교가 가장 오래 활동하고 그 인품도 강직했는데 그는 측천무후에게도 서슴지 않고 간언하곤 하였다.
② 沈宋
沈宋은 심전기와 송지문을 일컫는 말로써 이 두 사람은 측천무후와 중종의 궁정시인으로 각각 칠언과 오언율시에 능통하였다.
沈佺期(656~713)는 자가 雲卿이고, 相州 內黃 사람이며, 무후의 측근인 張易之에게 아첨했다가 中宗때 유배를 가게 된다.
宋之問(656~712)은 자가 延淸이고, 汾州 사람이다. 그 역시 심전기와 마찬가지로 張易之에게 아첨했다가 쫓겨나지만 후에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그는 본디 사람됨이 교활하고 악하여 갖은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다 결국 睿宗이 즉위하자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게 된다.
심전기와 송지문이 비록 인품에서는 好評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들의 작품은 높이 평가되어 「舊唐書」에서도 그들에대해
“심전기는 문장을 잘 지었는데, 특히 칠언의 작품에서 뛰어났다. 송지문은 그와 이름이 병칭되어 당시에 ‘沈宋’이라고 불렀다.”라고 평했다.
(3) 근체시의 형식
<五言絶句>
➣ 仄起式 (正格 : 起句의 제2자가 측자이고, 끝 3자가 ‘평평측’임
➣ 平起式 (偏格 : 起句의 제2자가 평자이고, 끝 3자가 ‘평측측’임
※ 주의 - 7언절구는 平起式이 正格이고, 仄起式이 偏格이다.
ex) 仄起 - 제1구의 끝 3자가 ‘평평측’ (平起는 ‘평측측’임)

cf) 7언의 경우에는 ‘二六對’(2/6번째 글자의 평측이 같음)를 지킨다. (‘二六當同’이라고도 함)
<五言律詩>
➣ 5언절구 : 제 2,4,6,8구의 끝자를 압운
➣ 7언절구 : 제 1,2,4,6,8구의 끝자를 압운
ex) 仄起(정격)

* 평성 : 낮고 일정한 소리
* 측성 : 상성, 거성, 입성과 같이 치우친 소리
* ○:평자 ◑/◐:평측 ●:측자 ◎:압운
* 不用下三連 : 시구의 맨 마지막 3글자는 서로 평측을 달리한다.
(평측이 동일한 下三平 혹은 下三仄을 엄격히 규제)
3. 盛唐 (713~765, 약53년)
(1) 시대적 배경
초당 말에 측천무후가 쫓겨난 뒤 中宗이 즉위하지만 그는 딸들인 長寧, 安樂, 宜城, 新都, 金城공주들과 함께 교만과 사치를 일삼다 결국 韋后에 의해 시해되고 睿宗이 즉위한다. 예종은 즉위하고 바로 자신의 왕위를 태자인 玄宗에게 양보하는데 이로써 초당의 궁정시인들은 모두 중종과 함께 주살되거나 유배되는 등 완전히 붕괴하게 된다. 당 현종이 즉위한 시기부터 안사의 난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기간을 성당이라 하며 당 제국이 극도의 번영을 누렸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활의 안정으로 시인들은 초당을 거치면서 잘 닦여진 시 형식에 삶 속에서 스며나온 사상을 실어 시는 고도의 발달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런 태평성대도 결국엔 황제와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 天寶 말년인 755년에는 안록산이 난을 일으켜 장안이 함락당한다.
(2) 성당 초기의 시인
성당 초기에는 진자앙의 개성적인 시풍에 영향을 받은 張九齡, 賀知章, 張說, 蘇頲 같은 작가들이 나와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발전한 낭만주의적 기질의 개성적인 시들을 창작하였다. 특히 장구령의 <感遇> 12수는 진자앙의 <感遇詩> 38수와 매우 비슷한 풍격을 지닌다. 장열과 소정은 성당 초기의 名相으로서 그 당시 조정의 중요한 글들은 모두 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여 사람들은 흔히 ‘燕許大手筆’이라 불렀다.
<回鄕偶書> -- 賀知章
少小離家老大回 젊어서 집을 떠나 늙어서 돌아와 보니
鄕音無改鬢毛衰 고향 말씨는 그대로되 머리는 희어졌구나
兒童相見不相識 아이들은 만나도 서로 알아보지 못하는데
笑問客從何處來 손님은 어디서 오셨느냐고 웃으며 물어오네
※ 오랫동안 외지에 살다가 고향에 돌아와 보니 세월은 이미 많이 흘렀고, 자신은 늙었다는 시인의 감회를 읊은 시이다.
<將赴益州題小園壁> -- 張說
歲窮惟益老 살림은 곤궁한데 나이는 더욱 늙었고
春至卻辭家 봄이 되자 또 집 떠나게 되었네
可惜東園樹 애석하게도 동원의 나무들은
無人也作花 주인 없어도 여전히 꽃 피우리라
(3) 自然詩 (山水田園詩)
산수전원시는 왕유와 맹호연을 대표로 하며 陶淵明과 謝靈運의 맥을 이어 산수의 아름다움과 전원의 한적한 생활을 노래하였다. 성당기에 이러한 자연시가 발달한 것은 불교와 도교의 성행으로 퍼진 은일자적인 사회적 기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장안 근처에서 은둔생활을 하다 명성을 쌓아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이 과거를 통해 진출하는 것보다 나았기 때문에 시인들이 은거하며 작시활동을 펼쳤다고 말하기도 한다.
자연시는 오언이 중심을 이루며, 자연을 노래할 뿐 사회나 민생의 문제는 도외시 했고, 시의 풍격이 매우 질박하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왕유와 맹호연은 함께 ‘王孟’이라 불리었다.
1) 王維(701~761)
자는 摩詰이며 河東 사람이다. 10대 때부터 벌써 훌륭한 시들을 짓기 시작했으며 젊어서는 출세에 대한 야망으로 초당의 시풍을 따라 시를 짓기도 하였다. 그러나 30세 무렵에 喪妻한 뒤로는 불교에 귀의하여 자연 속에서 焚香黙坐의 생활을 누리며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자 하였다. 그는 자신의 이름 ‘維’와 자, 摩詰을 합쳐 자신이 「維摩經」에 나오는 ‘유마힐’이라 자처하였다.
왕유는 그림에도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어 宋代의 蘇軾은 “왕유의 시를 감상하면 시 가운데 그림이 있고, 그의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림 가운데 시가 있다.”라며 그의 詩畵를 칭송하였다. 왕유의 전원시는 도연명에게서 발원한 것이지만 도연명은 白描에 뛰어나며 자신의 느낌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반면 왕유는 채색화에 소질이 있고 시의 내용은 주로 뛰어난 경치의 묘사였다.
<鹿柴>
空山不見人 빈 산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但聞人語響 다만 사람들 말소리 울림만 들리네
返景入深林 되비치는 햇빛 깊은 숲속으로 들어와
復照靑苔上 다시 파란 이끼 위에 비치네
* 空山 : 텅 빈 산
* 返景 :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햇빛
※ 왕유는 항상 시를 통해 세속의 먼지와 시끄러움을 멀리하는 ‘空’과 ‘寂’의 경지를 추구하였다.
2) 孟浩然(689~740)
字 역시 호연이며 襄陽 사람이다. 나이 40이 되어서야 출세를 하고자 뒤늦게 장안으로 나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는 왕유와는 달리 자연을 노래하면서도 끝내 출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왕유의 시가 객관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자신을 자연에 맞추고 있다면 맹호연의 시는 보다 동적이고 주관적이다.
<春曉>
春眠不覺曉 봄 잠에 날 밝는 줄 몰랐더니
處處聞啼鳥 곳곳에 새 소리 들리누나
夜來風雨聲 간밤엔 비바람 소리 들리더니
花落知多少 꽃은 얼마나 떨어졌을꼬
<過故人莊>
故人具雞黍, 邀我至田家
綠樹村邊合, 靑山郭外斜
開軒面場圃, 把酒話桑麻
待到重陽日, 還來就菊花
친구가 닭 잡고 기장밥 차려 놓고 나를 농가로 초청하였네
파란 나무들 마을 가에 우거져 있고 푸른 산은 성 밖에 비끼어 있네
창을 여니 마당과 채마전 보이는데 술잔 들고 농사 얘기하네
구월 구일 중양절이 되걸랑 다시 와서 국화 감상하기로 하자 하네
* 雞黍 :닭과 기장. 농촌사람들이 절친한 손님을 대접할 때 차리는 음식
* 郭外 :성밖 주변
* 桑麻 :뽕나무와 삼
* 重陽日 :음력 9월 9일
(4) 邊塞詩
당 제국의 번영에 낭만적인 자연시가 나왔는가 하면, 잦은 전쟁으로 인한 전장의 상황과 백성의 비참한 생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및 병사들의 고충을 그려낸 변새시가 있다. 이 변새파 시인들은 당의 外征이 무의미함을 깨닫고 이에 분개하여 변방에서의 힘든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린 시를 창작했다. 자연시가 5언을 위주로 하고 있다면 변새시는 7언장가를 위주로 하고 있다.
변새시인으로는 岑參, 高適, 王昌齡이 있는데 잠참은 河南 南陽 사람으로 오랜 동안 군막에서 벼슬을 하였기 때문에 변방의 거친 생활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잠참과 고적은 주로 7언가행을 지었고, 왕창령은 짧은 7언절구를 지었다.
이 밖에 王之渙 王翰도 <凉州詞>와 같은 7언절구의 훌륭한 작품을 남겼다.
<登觀雀樓> -- 王之渙
白日依山盡 눈부신 해는 산 너머 지고
黃河入海流 황하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네
欲窮千里目 천리 밖까지 바라보고자
更上一層樓 다시 누각을 한 층 더 오르노라
* 觀雀樓 :陝西省에 있는 3층 누각으로 황하가 내려다 보임
<出塞> -- 王昌齡
秦時明月漢時關 진나라 때도 비쳤던 밝은 달, 한나라 때도 있었던 관문
萬里長征人未還 만리 밖으로 전쟁하러 나간 사람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네
但使龍城飛將在 다만 용성에 비장군 같은 이만 있다면
不敎胡馬度陰山 오랑캐 군마 음산을 넘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을
* 飛將 :漢 무제 때의 李廣 장군을 일컬어 흉노족은 비장군이라 하였다
* 陰山 :흉노 땅에 있는 산 (지금의 내몽고자치구 북부)
※ 흉노족은 진한시대부터 끊임없이 중국의 서북방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당나라 때에도 전쟁은 끊이지 않아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나갔다. 왕창령은 이러한 참상을 고발하기 위해 이 시를 지었다.
<凉州詞> -- 王翰
葡萄美酒夜光杯 아름다운 포도주를 백옥 술잔에 부어
欲飮琵琶馬上催 막 마시려는데 말 위에서 타는 비파 소리가 떠나기를 재촉하네
醉臥沙場君莫笑 취하여 모래밭에 눕는다 하더라도 그대 비웃지 말게나
古來征戰幾人同 옛부터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몇이나 살아 돌아왔던가
(5) 詩仙 李白(701~762)
자는 太白, 호는 靑蓮居士이다. 그의 어머니가 태백성을 태몽으로 꾸었기 때문에 자를 태백으로, 靑蓮鄕에 살았기 때문에 호를 청련거사라 하였다. 출생지에 대한 설은 분분하나 그중 한 가지를 들어보면 祖籍은 隴西 成紀, 甘肅省 天水縣 부근이고, 隋 말에 그의 조상이 죄를 지어 서역으로 옮겨갔다가 그가 5세쯤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四川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백이 어디에서 출생했는지 그의 어머니가 한족인지 오랑캐 여자였는지는 전해지지 않는다.
이백은 26세에 벼슬을 하기 위해 사천을 떠나 湖北ㆍ湖南ㆍ江蘇ㆍ山東ㆍ山西ㆍ河北ㆍ河南 등지를 두루 돌아다녔다. 그 사이 30세에 호북성의 安陸에서 재상 許圉師의 손녀와 혼인하고, 후에 강남지방에서 다시 장가를 들어 슬하에 자녀를 둔다. 42세 무렵에 이백은 吳筠의 천거를 받아 장안으로 들어가 玄宗 밑에서 翰林學士의 벼슬을 한다. 이 때 賀知章은 이백의 시를 읽고는 “하늘 위로부터 귀양 온 신선”이라며 찬탄했다. 그러나 이백은 정치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권력자들의 모함으로 결국 3년 만에 다시 유랑을 시작한다. 그러나 그 3년 동안 이백은 종종 현종에게 불려가 시를 짓곤 했는데 이때 당시의 세력가인 高力士에게 자신의 신발을 벗기도록 하고, 애첩인 楊貴妃에게는 벼루를 받쳐 들게 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백은 유랑을 하면서 우연히 두보를 알게 되어 우의를 나누는데 후에 두보는 자신이 천재적 시인을 만났다는 기쁨을 감출 수 없어 이백에 대해 <寄李十二白二十韻>이란 시를 짓기도 하였다.
안사의 난이 일어난 것은 그가 55세 되던 해의 일로 이백은 廬山으로 피난하여 그곳에 은거하며 많은 시작활동을 펼친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永王 李璘의 막료가 되었다가 영왕이 일으킨 반란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으나 郭子儀의 도움으로 간신히 면하게 된다. 이 때 그의 나이는 이미 59세였고, 몸 붙일 곳이 없었던 이백은 當塗령으로 있던 친척 李陽冰을 찾아가 그 집에 얹혀살다가 병을 얻어 62세에 사망한다. 세간엔 그가 술에 취하여 采石磯에서 물에 뜬 달을 건지려다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나중에 생겨난 전설이다.
이백은 진자앙을 흠모하여 풍골을 중시하며 복고적인 문학을 계승하려 하였다. 그는 본래 협기가 있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돈과 재물을 우습게 여기는 호방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또한 그는 자주 산 속에 숨어 술을 마시며 遊仙의 생활을 하는 등 도가적인 색채를 띠는가 하면, 시를 통해 유가사상을 피력하기도 하고, 백성의 궁핍한 생활을 그리기도 하는 등, 시의 내용에 있어 그 범위가 무척 광대하여 游仙詩, 飮酒詩, 邊塞詩, 宮體詩 등의 다양한 시들을 창작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자유분방하게 노래하기에는 율시보다 고시, 가행, 절구의 형식이 더 적합하여 그의 작품에는 5ㆍ7언의 고시가 많고 율시가 적다.
이백은 특히나 술을 좋아하는 데다 성격이 호쾌하여 쉽게 사람들과 친분을 맺었었다.
하지장, 맹호연, 두보, 고적, 장욱, 공소문, 오균 등 그야말로 당대의 호걸이라 할 수 있는 유명한 시인들과 교류를 가졌으며 그중 두보는 이백의 술 좋아함을 두고 <酒中八仙歌>에서 “이백은 술 한 말이면 시 백편을 짓는다.” 하였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將進酒>, <古風> 59수, <蜀道難>, <月下獨酌>, <山中問答>, <望廬山瀑布> 등이 있다.
<靜夜思>
床前明月光 침대 머리에 밝은 달이 비치니
疑是地上霜 땅 위에 서리가 내린 듯
擧頭望明月 고개 들어 밝은 달 바라보고
低頭思故鄕 머리 숙여 고향을 그리네
* 靜夜思 :고요한 밤의 생각
* 床 :침대, 잠자리
<山中問答>
問余何事栖碧山 내게 무엇하러 푸른 산에 사느냐고 묻기에
笑而不答心自閑 웃으면서 대답은 않았지만 내 마음은 한가롭네
桃花流水窅然去 복사 꽃잎이 떠 흐르는 물 아득히 흘러가니
別有天地非人間 이곳은 별천지지 인간 세상이 아니로구나
* 栖 :머물다, 살다
* 自閑 :스스로 한가롭다
* 窅然 :아득한 모양 (=杳然)
* 別有天地 :무릉도원 같은 별천지가 있다
※ 이는 이백의 대표적인 시 중 하나로, 산중에 숨어 살며 자연에 완전히 융합되길 바라는 마음을 그린 것이다
<月下獨酌>
花間一壺酒, 獨酌無相親
擧盃邀明月, 對影成三人
月旣不解飮, 影徒隨我身
暫伴月將影, 行樂須及春
我歌月徘徊, 我舞影凌亂
醒時同交歡, 醉後各分散
永結無情遊, 相期邈雲漢
꽃 사이에 한 동이 술을 놓고 홀로 마시니 가까운 이 없네
잔을 들어 밝은 달 맞이 하고 그림자를 대하니 세 사람이 된 셈이네
달은 본시 술 마실 줄 모르고 그림자는 공연히 내 몸을 따르고 있네
잠시 달과 그림자를 벗함은 인생의 행락은 모름지기 봄에 해야 하는 때문이네
내가 노래하면 달은 머뭇거리고 내가 춤을 추면 그림자가 어지럽게 흔들리네
아직 깨었을 적에는 함께 서로 즐기지만 취한 뒤에는 각기 헤어지네
세속적인 정을 떠난 사귐을 맺고자 멀리 은하수를 향해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네
* 三人 :달, 그림자, 자기 자신
* 解 :‘能’의 뜻임, ~할 줄 안다
* 將 :~와 함께
* 凌亂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 <이태백시집> 권23에 실린 4수 중, 제 1수로써 달이나 그림자처럼 헤어져도 석별의 정을 안 느껴도 되는 벗들과 영원한 교유를 갖겠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연과 완전히 융화된 仙人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將進酒>
君不見黃河之水天上來, 奔流到海不復回?
君不見高堂明鏡悲白髮, 朝如靑絲暮成雪?
人生得意須盡歡, 莫使金樽空對月.
天生我材必有用, 千金散盡還復來.
烹羔宰牛且爲樂, 會須一飮三百杯.
岑夫子, 丹丘生, 將進酒, 君莫停.
與君歌一曲, 請君爲我側耳聽.
鐘鼓饌玉不足貴, 但願長醉不願醒.
古來聖賢皆寂寞, 惟有飮者留其名.
陳王昔時宴平樂, 斗酒十千恣歡謔.
主人何爲言少錢? 徑須沽取對君酌.
五花馬, 千金裘, 呼兒將出換美酒.
與爾同銷萬古愁.
그대 보지 못했는가, 황하 물이 하늘 위로부터 흘러내려
세차게 흘러 바다로 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고대광실 밝은 거울 앞에 흰 머리 슬퍼하고 있는데
아침에는 푸른 실 같던 것이 저녁에는 눈처럼 되었음을?
인생이란 득의할 때 실컷 즐겨야만 하는 것이니
금 술독 부질없이 달 마주 대하고 있게 버려두지 말게나.
하늘이 나라는 인재를 내신 것은 반드시 쓰일 데가 있기 때문이니
돈이란 있는 대로 다 써버린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네.
양 삶고 소 잡아 놓고는 그저 즐길 일이니
모름지기 한 번 마셨다 하면 삼백 잔은 마셔야지.
잠형! 단구군! 술 잔 권하노니 멈추지 말고 들게나!
그대들 위해 노래 한 곡 부를 것이니
제발 날 위해 귀 기울여 들어주게!
풍악 울리면 진귀한 음식 먹는 것은 소중한 일 아니니
다만 언제나 취하여 다시 깨어나지 않기 바랄 따름이네.
예부터 성현들이 있었다지만 모두 이름 잠잠해지고
오직 술 마신 사람들만이 그들 이름 남기고 있네.
진왕 曹植이 옛날 平樂觀에서 잔치할 적엔
천만금 나가는 술도 몇 말이고 멋대로 마시며 즐기게 했었네.
주인장은 어찌하여 돈이 모자란다고 말하는가?
곧장 술을 받아다가 모두 함께 대작해야지.
오색의 명마와 천금의 갑옷 내줄 것이니
아이 불러 갖고 나가 좋은 술과 바꿔 오도록 하게.
그대들과 함께 마시며 만고의 시름 녹여보려네.
* 高堂 :높고 넓은 대청
* 靑絲 :푸른 검푸르고 윤기나는 머리
* 會須 :반드시
* 岑夫子 :岑助 혹은 岑參으로 보임
* 丹丘生 :元丹丘
* 鐘鼓饌玉 :좋은 음악을 연주하고 좋은 음식을 먹음
* 陳王 :曹植
* 五花馬 :오색의 잡모를 지닌 좋은 말
* 千金裘 :천금의 좋은 갖옷
* 萬古愁 :만고로부터 지니고 있던 인생의 시름
※ 장진주는 원래 전한시대에 군악으로 사용되던 鼓吹斛이라 불리는 징과 단소의 합주곡이다. 여기에 많은 시가 가사로 지어졌는데 이백의 장진주 역시 그중 하나이다. ‘君不見’은 악부시에 자주 쓰인 관용어구로 상대방이 알고 있는 당연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설의법이다. 이 시의 내용은 세상의 만고 시름을 다 잊고 지금의 이때를 술 마시며 즐겨보자는 것이다.
《 참고문헌 》
* 안병국, 「唐詩槪論」, 청년사, 1996.
* 김학주, 「唐詩選」, 명문당, 2003.
* 김학주, 「중국명시감상」,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2004.
* 오가와 小川環樹, 「당시개설」, 이회문화사, 1998.
* 이수웅, 「역사 따라 배우는 중국문학사」, 다락원, 2001.
* 신진호, 「중국문학사의 이해」, 지영사, 1998.
* 유성준, 「初唐詩와 盛唐詩 연구」, 국학자료원, 2001.
'漢詩와 漢文' 카테고리의 다른 글
| 對酒(蝸角之爭)-白樂天 (0) | 2025.02.03 |
|---|---|
| 老驥伏櫪 志在千里 (0) | 2025.01.21 |
| 武夷九曲歌(무이구곡가) (3) | 2024.01.25 |
| 도자설(盜子說)-강희맹(姜希孟) (2) | 2024.01.04 |
| 비사불우부 (悲士不遇賦) (1) | 2023.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