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303.嫦娥(상아)-李商隱(이상은)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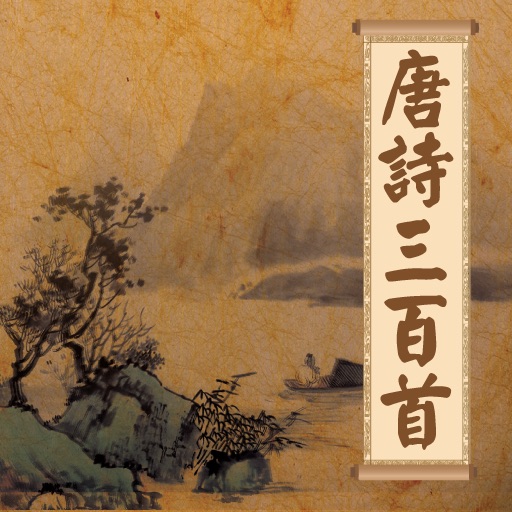
1.題目 作者 原文 解釋
| 嫦娥〈상아〉 -李商隱(이상은) |
雲母屛風燭影深 長河漸落曉星沈.
운모병풍에 촛불 그림자 짙은데 은하수 점점 기울어 새벽별 희미하다.
嫦娥應悔偸靈藥 碧海靑天夜夜心.
상아는 응당 후회하리라 영약 훔친 것을 푸른 바다 파란 하늘에 밤마다 홀로 지내는 마음.
2.通釋
화려하고 아름다운 운모병풍에 촛불 그림자 짙게 드리우면서 밤은 깊어간다.
어느덧 은하수도 기울어 새벽이 되니, 별들도 빛이 바래 희미하다.
이렇게 홀로 새우는 밤, 불사약을 먹고 신선이 되어 달로 도망간 상아는 바로 나 같은 처지였을 테니, 신선이라 한들 자신의 고독한 처지를 후회했으리라. 아무도 없는 세상 하늘과 바다는 온통 푸르기만 한데 밤마다 홀로 지내는 마음 어이 후회하지 않겠는가.
3.解題
이 시가 무엇을 읊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역대로 논의가 분분하다.
女道士를 풍자한 작품이라는 설이 있고 悼亡詩로 읽기도 하며, 또 ‘流落不遇’의 정을 읊었다고 보기도 하고 스스로 참회하는 시로 풀기도 한다.
일단은 고적하고 처량한 정이 드러나 시인의 불우한 신세를 기탁한 작품으로 읽었다.
홀로 지새는 밤, 문득 생기는 쓸쓸한 심회. 하지만 이 심정을 곧바로 드러내지 않고 상아를 빌려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이 셋째 단락은 복잡한 심경을 담아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道를 닦아 애써 세상을 벗어났건만 그것만으로 전부가 아니었다는 心懷가 表明되어 있다.
이런 뒤얽힌 심사가 이 시를 간단히 볼 수 없도록 한다.
4.集評
○ 語想俱刻 夜夜心三字 却下得沈渾 - 明 鐘惺, 《唐詩歸》
언어와 생각이 모두 심각한데, ‘夜夜心’ 세 글자는 沈渾한 경지에 닿았다.
○ 嫦娥指所思之人也 作眞指嫦娥 癡人說夢 - 淸 屈復, 《玉溪生詩意》
상아는 그리워하는 사람을 가리킨 것인데 진짜로 상아를 가리킨다 하였으니, 바보가 해몽을 하는 격이다.
○ 此亦刺女道士
이 작품도 여도사를 풍자하였다.
首句言其洞房深曲之景 次句言其夜會曉離之情
첫 구절은 깊은 방의 은미하고 곡진한 광경을 말하였고, 다음 구절은 밤에 만나 아침에 이별하는 정을 말하였다.
下二句言其不爲女冠 儘堪求偶 無端入道 何日上昇也 則心如懸旌 未免悔恨於天長海闊矣 - 淸 程夢星, 《李義山詩集箋注》
다음 두 구절은 여도사가 되지 못하고 온통 짝을 구하느라 도에 들어갈 실마리조차 없으니 어느 날에나 승천하겠느냐고 말하였으니, 마음이 공중에 매달린 깃발과 같아 드넓은 하늘과 광활한 바다에서 후회를 면치 못한 것이다.
○ 或爲入道而不耐孤孑者致誚也 - 淸 馮浩, 《玉溪生詩集箋注》
혹은 도에 들어갔는데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을 꾸짖은 작품이다.
○ 孤寂之況 以夜夜心三字盡之 士有爭先得路而自悔者 亦作如是觀 - 淸 沈德潛, 《唐詩別裁集》 卷20
고적한 상황을 ‘夜夜心’ 세 글자로 다 나타냈다.
선비 가운데 앞다투어 먼저 길을 나섰다가 스스로 후회하는 사람 역시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 何焯云 自比有才調飜致流落不偶也
何焯이 말하였다.
“재주가 있으면서 도리어 전락해 불우한 사람이 되었음을 스스로 빗댄 것이다.”
紀昀云 意思藏在第一句 却從嫦娥對面寫來 十分蘊藉
紀昀이 말하였다.
“생각은 제1구에 간직되어 있다.
상아를 대면하고 묘사한 듯 대단히 온화하다.
此悼亡之詩 非詠嫦娥 - 淸 深厚塽, 《李義山詩集輯評》
이 작품은 悼亡詩이지 상아를 읊은 것이 아니다.”
○ 寫永夜不眠 悵望無聊之景況 亦託意偶合之作
긴 밤 지새며 잠 못 이루고 무료한 풍경과 상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음을 묘사하였으니, 또한 자신의 뜻을 부치다가 우연히 의도에 잘 부합된 작품이다.
嫦娥偸藥 比一婚於王氏 結怨於人 空使我一生懸望 好合無期耳
‘상아가 불사약을 훔쳤다.’는 말은 왕씨와 한 번 결혼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사 헛되이 평생토록 희망만 바라보는 처지가 되고 말아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날 기약이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若解作悼亡詩 味反淺矣
만약 悼亡詩로 썼다고 풀이한다면 시의 맛이 오히려 얕아진다.
馮氏謂刺詩 似誤 - 淸 張采田, 《李義山詩辨正》
馮氏(馮浩)는 풍자시라고 하였는데 틀린 것 같다.
○ 借嫦娥 抒孤高不遇之感 筆舌之妙 自不加及 - 淸 宋顧樂, 《唐人萬首絶句選》
상아를 빌려 고고하고 불우한 느낌을 토로했다.
필설의 오묘함은 저절로 미칠 수 없다.
○ 嫦娥偸藥 本屬寓言 更懸揣其有悔心 且萬古悠悠 此心不變 更屬幽玄之思 詞人之戱筆耳 - 現代 兪陛雲, 《詩境淺說》
‘상아가 불사약을 훔쳤다.’는 말은 본래 우언에 속한다.
거기에 후회하는 마음이 있음을 헤아리고 또 영원토록 이 마음이 변치 않으리라 하였으니, 또 깊은 그리움에 속하기도 한다.
이 작품은 시인의 戱筆일 뿐이다.
5.譯註
▶ 嫦娥 : 恒(姮)娥 혹은 羲娥라고도 쓴다.
《淮南子》 〈覽明訓〉에 보인다.
夏나라 때 有窮의 군주인 夷羿의 아내로 羿가 西王母에게 不死藥을 구했는데 恒娥가 이 약을 몰래 훔쳐먹고 신선이 되어 달로 도망가 달의 정령[月精]이 되었다.
이 시 전체가 恒娥의 이러한 행동을 모티브로 삼았다.
▶ 雲母屛風 : 아름다운 雲母石으로 만든 병풍으로, 귀부인의 방을 장식하는 데 쓰였다.
▶ 長河 : 은하수를 가리킨다.
6.引用
이 자료는 동양고전종합DB http://db.cyberseodang.or.kr/front/main/main.do 에서 인용하였습니다. 耽古樓主.
'漢詩와 漢文 > 당시300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05.瑤瑟怨(요비원)-溫庭筠(온정균) (0) | 2023.12.16 |
|---|---|
| 304.賈生(가생)-李商隱(이상은) (0) | 2023.12.16 |
| 302.瑤池(요지)-李商隱(이상은) (0) | 2023.12.16 |
| 301.隋宮(수궁)-李商隱(이상은) (0) | 2023.12.16 |
| 300.爲有(유위)-李商隱(이상은) (0) | 2023.1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