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태평한화골계전8-禿頭贊歌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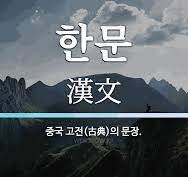
太平閑話滑稽傳
禿頭贊歌
孔先生嘗泛舟驪江墮水, 拯者初捽其髮不得 再捽其髥而出之.
孔先生(孔頎)이 배를 타고 여강(驪江)을 건너다가 물에 빠진 적이 있는데, 건져 주는 사람이 처음에 머리카락을 잡으려 했으나 잡을 수가 없어, 다시 수염을 잡아 그를 구출했다.
▶驪江: 경기도 여주목 북쪽에 있는 강으로, 한강의 상류다.
▶건져 주는・・・ 잡을 수가 없어: 공기가 대머리였기 때문에 잡을 머리카락이 없었다는 말이다.
▶拯(증): 건지다.
▶捽(졸): (머리채를)잡다.
孔挽髥祝之曰
“德哉髥乎! 微爾吾將與屈原而同遊矣”
孔이 수염을 어루만지며 축복했다.
"크도다, 수염이여, 네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거의 굴원(屈原)과 함께 놀았으리라“
▶屈原: 중국 전국시대 초(楚)나라의 시인이다. 삼려대부(三閭大夫)를 지냈기 때문에 "굴삼려(屈三閭)”라고도 불린다.
▶굴원과 함께 놀았으리라: 물에 빠져 죽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굴원이 멱라수(汨羅水)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다.
後中庚午科 同榜權安世者 年齒與頎相敵 而鬚髥盡白.
그 후 경오년(庚午年)의 과거에 급제했는데, 함께 급제한 權安世라는 사람은 나이가 孔頎와 서로 비슷했으나 수염은 온통 하얬다.
▶庚午: 세종 32년(1450)이다. 그러나 여기서 “경오년”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는 그해에 공기가 권안세와 함께 과거에 급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선왕조실록≫과 대조해 보면 권안세가 과거에 급제하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임금의 특별한 배려를 받아 벼슬을 받은 것은 세종 29년의 일로 되어 있다. 즉 권안세는 세종 29년 4월 3일[갑자(甲子)]에 이승소(李承召) 등과 함께 문과에 급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경오년"은 바로 전의 식년시(式年試)가 있었던 세종 29년 '정묘년(丁卯年)'의 착오이리라.
▶權安世: 단종(端宗) 3년에 사간원 우헌납(司諫院右獻納)이 되고, 세조 3년 원종공신(原從功臣) 3등으로 녹훈되었다.
▶同榜: 같이 과거에 급제해 방목(榜目)에 같이 이름이 적히는 일, 혹은 그런 사람을 말한다. 사람을 가리킬 때는 '동년(同年)'과 같은 말이다.
上哀其老 優秩用之 孔挽髥數之曰
“寃哉髥乎! 當白不白 使我不爵乎”
임금께서 그가 늙었음을 애석하게 생각해서, 좋은 관직에 그를 등용하매, 공이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책망하였다.
“원망스럽구나, 수염이여. 마땅히 희어야 하는데 희지 않아서 나를 벼슬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조선왕조실록> 세종 29년 4월 3일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전날의 교도(敎導) 권세가 머리가 아주 하얬는데 역시 문과에 합격했다. 임금께서 그가 늙어도 학업은 폐하지 않은 것을 가상히 여겨 정과(正科)로 발탁해 예빈주부(禮賓注簿)를 배명하니, 사림(士林)에서 영화롭게 여겼다.“
▶挽(만): '잡아당기다'라는 뜻이다. 문맥을 고려하면 '쥐어뜯으면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하다.
▶數(수): 책망하다. '죄목을 일일이 들추어 헤아리면서 꾸짖다'의 의미다.
嘗醉 撚髥而笑曰
此物一德一寃 德於驪江 而寃於安世也.
한번은 취해서 수염을 어루만지다가 웃으며 말하였다.
“이 물건은 한번은 덕(德)이 되고, 한번은 寃이 되었으니, 여강에서는 덕이 되었고, 안세(安世) 에 있어서는 원이 되었도다”
孔平生不露髺 拜監察 乘醉落帽而露.
공은 평생 상투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감찰(監察)에 임명되었을 때 잔뜩 취해 모자가 떨어져서 (상투가) 드러나게 되었다.
▶監察: 조선 시대 사헌부에 두었던 정육품 벼슬의 이름이다.
▶髺(괄): (머리를)묶다
殿中作孔髡贊曰
銅頭不毛之地 凜凜然童童然.
如鑑之明 燭之而姸蚩自現.
如磬之磨 叩之而音韻若在.
脫有利天下之事 摩頂放踵 猶可爲也 拔一毛不可能也
殿中이 공의 머리카락 없음을 찬(讚)하여 글을 지었다.
"벗어진 머리는 털도 나지 않은 곳이라 늠름하고 민둥민둥하네.
밝기가 거울 같아서 비추면 아름다움과 추함이 저절로 드러나네.
경쇠를 갈아 놓은 듯하여 두드리면 소리가 날 듯하다.
천하의 일에 이익이 됨을 기뻐하여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가는 것은 가(可)할지라도, 한 터럭을 뽑는 것은 불가능하다.”
▶殿中: '감찰'을 말한다. 고려 시대의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를 조선시대에는 사헌부 감찰로 고쳐 불렀다.
▶동동연(童童然): 여기서는 '머리카락이 없어 반들반들한 모양'을 말한 것이다.
▶밝기가 거울 같아서…스스로 드러나네: 대머리가 거울처럼 반질반질해서 사물을 비추면 그 모습이 그대로 대머리에 훤하게 비쳐 드러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姸蚩: 아름다움과 추함, 혹은 좋고 싫음[好惡]의 뜻이다.
▶磬: 경쇠로, 옥이나 돌로 만든 아악기(雅樂器)이다.
▶脫(태): 여기서는 '기뻐하다'라는 뜻이다.
▶마정방종 유가위야(摩頂放踵
맹자집주 진심장구 상 제26장
孟子曰: 「楊子取爲我, 拔一毛而利天下, 不爲也. 孟子가 말하였다. “楊子는 겨우 자신을 위함에 만족하여, 하나의 털을 뽑아서 天下가 이로울지라도 행하지 않았다. 楊子, 名朱. 楊子는 이름이
koahn.tistory.com
猶可爲也): ‘정수리(頂--)부터 발꿈치까지 모두 닳는다.’는 뜻으로, 온몸을 바쳐서 남을 위하여 희생(犧牲)함을 이르는 말.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갈면 머리는 대머리가 될 테니, 그것은 공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다. 이 구절은 본래 <맹자> <진심장구상(盡心章句上)>에서 묵자(墨子)의 겸애설(兼愛說)을 말한 부분에 들어 있다. 원전에서 의역한다면, '묵자같이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정도가 될 수 있겠다.
▶ 放: 至也. 放은 이름이다.
▶발일모불가능(拔一毛不可能也): 공은 대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를 뽑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이 구절은 본래 <맹자> <진심장구상>에서 양자(楊)의 자애설(愛說)을 말한 부분에 들어 있다. 원전에서 의역한다면, '양자처럼 함은 불가능하다' 정도가 되겠다.
'漢詩와 漢文 > 太平閑話滑稽傳'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태평한화골계전10-西天吾不欲往也 (0) | 2024.11.12 |
|---|---|
| 태평한화골계전9-甘醴不醉 (0) | 2024.11.12 |
| 태평한화골계전7-頭禿酒之禍也 (0) | 2024.11.10 |
| 태평한화골계전6-念觀察使云仡 (0) | 2024.11.08 |
| 태평한화골계전5-寒士紅裙會 (1) | 2024.1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