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태평한화골계전20-不文孰甚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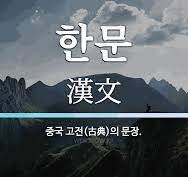
太平閑話滑稽傳
不文孰甚
閔中樞發崔中樞迪 皆武而不文.
중추(中樞)인 민발(閔發)과 최적(崔迪)은 모두 무신으로 글을 몰랐다.
▶중추: 中樞院使. 조선 시대 중추원의 정이품 벼슬 이름이다.
▶閔發[세종 1년(1419)~성종 13년(1482)]: 무신으로 자는 분충(奮忠),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여기서 “崔迪”은 '崔適'의 오기인 듯하다. <예종실록>(제7권) 예종원년 8월 정묘일의 기록에는 분명히 “崔適”이라고 되어 있다[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예종실록 2≫, 1979,260].
上曰
汝二人 不文孰甚?
임금께서 물었다.
"자네들 두 사람 중 글을 못함이 누가 더 심한가?"
▶임금: ≪睿宗實錄)≫(제7권) 예종 원년 8월 정묘일(丁卯日, 이해의 음력 8월 16일이 정묘일이었다)의 기록에 의하면 세조(世祖)를 말한다.
迪曰
發之奴有涉津梁者 請書捕亡 發誣曰今日是父忌 不書.
發之不文甚於臣.
崔迪이 말하였다.
“ 閔發의 奴僕에 나루와 다리를 건너야 할 자가 있어서 포망(捕亡)을 써 주기를 청하자, 발이 속여서 말하기를 '오늘은 아버님의 제삿날이라서 글을 쓰지 못하네'라고 했습니다.
閔發이 글을 못함이 저보다 심합니다.”
▶포망: 천례(賤隷)가 나루를 건너려고 할 때 주인으로부터 발급받는 일종의 증명서를 말한다. ≪예종실록> 원년 8월 정묘일의 기록에 “무릇 천례가 나루를 건너고자 한다면 제 주인의 書簡을 증명으로 삼으며, 그것이 없으면 잡아서 고(告)하는데, 이것을 속칭 포망이라 한다. 渡津 以其書簡爲驗 無則捕告 俗謂之捕亡)"라고 했다[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예종실록 2≫, 1979, 260쪽. 번역 및 표기는 이에 따랐다.]
發曰
迪嘗遊繕工監前 有外吏持官帖示迪曰
所載者何物
迪熟視曰
炭燒木也
外吏曰
吾所納者 魚物何云爾也?
迪怒目瞪視曰
若是魚物 何不示我於司宰監前乎?
臣不書捕亡 迪不識字 迪之不文 甚於臣
閔發이 아뢰었다.
"제가 繕工監 앞에 간 적이 있는데, 外吏가 官帖을 가지고 와서 崔迪에게 보여 주며, '적혀 있는 물건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崔迪이 자세히 보고는, '숯과 땔나무로구나'라고 했습니다.
외리가 말하였습니다
'제가 바친 것은 물고기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崔迪이 눈을 부라리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하였습니다.
'만약 물고기였다면 어찌해서 사재감(司宰監) 앞에서 나에게 보이지 않았더란 말이냐?'라고 했습니다.
저는 포망을 쓰지 못했지만, 글자를 식별하지도 못하니 崔迪의 글을 모름이 저보다 심합니다."
▶繕工監: 조선 시대에 토목 · 영선(營繕)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의 이름이다. 태조 원년에 베풀어 고종 31년에 폐했다.
▶繕工監前: "前"이 순암본에는 빠져 있어서 문맥이 잘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송본 · 일사본 · 민자본에는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이에 따라 보충하고 번역하였다.
▶외리: 지방 고을의 아전을 말한다. 여기서는 지방에서 올라와 선공감과 사재감에 배속되어 여러 관청의 숯과 땔나무를 조달하던 아전을 말하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경역리(京役吏)'라고 한다.
▶관첩: 관청에서 쓰는 서류 묶음을 말한다. 오늘날 공문서라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여기서는 경리가 숯과 땔나무를 바친 후 그 증빙으로 받아두는 문서를 말한다.
▶조선 초기에 숯을 거두어 들여서 궁중이나 관청에서 사용했는데, 근으로 달아서 받아들이고 내줄 때에도 근으로 달아서 주었다.
▶땔나무: 원문에서는 “분목(焚木)”이라고 했으나, '소목(燒木)'이 옳다고 판단된다.
▶최적이 글자는 몰랐지만, 그 아전이 경역리라고 짐작했고, 경역리는 숯과 땔나무를 납입하는 아전임을 알고 있었으매,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이해된다. 그 아전이 선공감 앞에서 쪽지를 내보였기 때문에 최적은 선공감에 배속된 경역리인 줄로 알고 숯과 땔나무라고 대답했다는 뜻이다.
▶사재감. 조선 시대에 궁중에서 쓰는 생선. 고기·소금·땔나무 숯 등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이다.
▶만약 사재감 앞에서 쪽지를 보여 주었더라면, 사재감과 관계된 물건인 줄 알고 물고기라고 대답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 瞪: 바로 보다, 주시하다 노려보다, 쏘아보다
上大笑.
임금께서 크게 웃으셨다.
'漢詩와 漢文 > 太平閑話滑稽傳'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태평한화골계전22-屠門戒殺 (0) | 2024.11.21 |
|---|---|
| 태평한화골계전21-不用建中湯 (0) | 2024.11.19 |
| 태평한화골계전19- 失天下者必此兒 (1) | 2024.11.16 |
| 태평한화골계전18-大便秘澁 (0) | 2024.11.16 |
| 태평한화골계전17. 君之子姓竹 (0) | 2024.1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