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35.溪居(계거)-柳宗元(유종원)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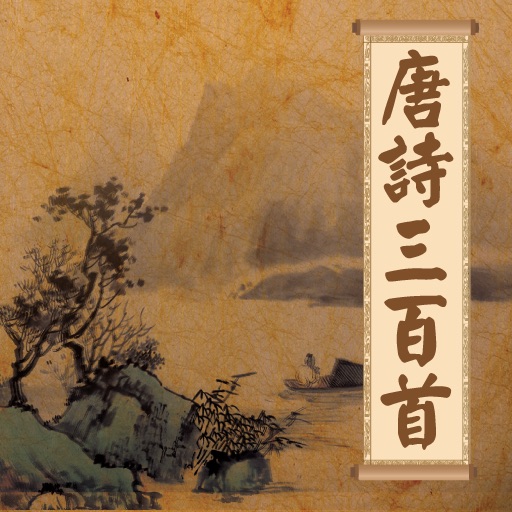
1.題目 作者 原文 解釋
| 溪居(계거) -柳宗元(유종원) |
久爲簪組累, 幸此南夷謫.
閑依農圃鄰, 偶似山林客.
오랫동안 관직에 매여 있다가, 다행히 이 남쪽 땅에 좌천되었네
한가롭게 농부의 이웃이 되어 살아가고, 어떤 때는 산림의 은자인 듯하구나
曉耕翻露草. 夜榜響溪石.
來往不逢人, 長歌楚天碧.
새벽엔 밭을 갈며 이슬 젖은 풀 뽑고, 밤에는 노 젓는 소리, 냇가 돌에 메아리치네.
오고가며 사람을 만날 수 없는데, 긴 노랫가락에 초 땅의 하늘 푸르구나
2.通釋
오랫동안 관직에 얽매어 있었는데, 좌천되어 남쪽 땅으로 오게 된 것이 다행이구나.
하는 일 없이 한가롭게 농사짓는 이들과 이웃하며 지내니 뜻밖에도 산림 속의 은자가 된 듯하다.
아침에는 밭일을 하면서 이슬에 젖은 풀을 갈아엎고, 저녁에는 배를 타고 노를 저으니 노 젓는 소리가 돌에 부딪쳐 메아리친다.
오고 가는 길에 사람 하나 마주치지 않는 외딴 곳에서 홀로 길게 노래하니 그 노랫소리 울려 퍼지는 남쪽 하늘이 끝없이 푸르다.
3.解題
유종원은 王叔文의 新政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永贞 元年(805) 9월 신정이 실패하자 邵州刺史로 좌천되었고, 11월에는 永州司马로 좌천되어 그곳의 龍興寺에 거처했다. 元和 5年(810)에 零陵의 남서쪽을 유람하다가 冉溪를 발견하였는데, 그곳 경치의 수려함에 반해 거처를 옮기고 이름도 ‘愚溪’라고 바꿨다. 이 작품은 愚溪에 정착한 초기에 지은 것으로, 《古文眞寶》에 〈愚溪詩序〉가 있다.
이 시는 작자의 은거생활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한가한 정취를 드러내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 담백한 배후에는 비분의 정서가 스며있다. 즉 초나라 하늘 아래서 長歌를 부르며, 울분에 찬 마음을 고독하게 토로하고 있는 유종원의 모습을 상상케 하기 때문이다.
4.集評
○ 愚溪諸詠 處運蹇困厄之際 發淸夷淡泊之音 不怨而怨 怨而不怨 行間言外 時或遇之 - 淸 沈德潛, 《唐詩別裁集》 卷4
愚溪에서 지은 여러 시들은 순탄치 않은 운명과 곤액에 처해서도 맑고 평이하며 담박한 소리를 내었으니, 원망하지 않으면서도 원망하고 원망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음을 행간의 말 이면에서 때때로 만나게 된다.
5.譯註
▶ 簪組 : ‘簪’은 관이 벗겨지지 않도록 관의 끈을 꿰어 머리에 꽂는 비녀이고, ‘組’는 인장을 매는 끈을 말한다. 모두 벼슬아치의 물건으로 관직생활을 뜻한다.
▶ 南夷 : 남쪽 변방지역을 일컫는 말인데, 여기서는 좌천되었던 永州를 가리킨다.
▶ 榜 : 《全唐詩》 주에 ‘一作塝’이라 하였고 章燮本에는 ‘傍’으로 되어 있는데, ‘夜榜’과 ‘曉耕’이 대구가 되므로 ‘榜’(노젓다)으로 보았다.
▶ 楚天 : 초 땅의 하늘로, 永州는 춘추전국시대 楚나라에 속했으므로 楚天이라 하였다.
6.引用
이 자료는 동양고전종합DB http://db.cyberseodang.or.kr/front/main/main.do 에서 인용하였습니다. 耽古樓主.
'漢詩와 漢文 > 당시300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7.塞下曲其二(새하곡기이)-王昌齡(왕창령) (0) | 2023.11.01 |
|---|---|
| 36.塞下曲(새하곡)-王昌齡(왕창령) (0) | 2023.11.01 |
| 34.晨詣超師院讀禪經(신예초사원독선경)-柳宗元(유종원) (1) | 2023.11.01 |
| 33.送楊氏女(송양씨녀)-韋應物(위응물) (0) | 2023.10.30 |
| 32.東郊(동교)-韋應物(위응물) (0) | 2023.1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