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102.送友人〈송우인〉-李白(이백)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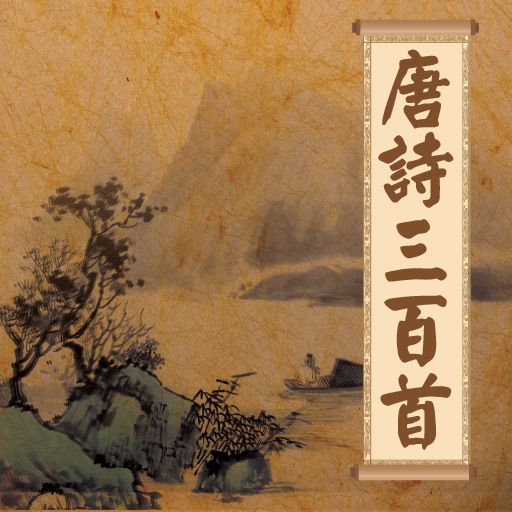
1.題目 作者 原文 解釋
| 送友人〈벗을 보내며〉 -李白(이백) |
靑山橫北郭 白水繞東城.
靑山은 북쪽 성곽에 비껴 있고 白水는 동쪽 성을 돌아간다.
此地一爲別 孤蓬萬里征.
이 땅에서 한번 이별하면 외로운 쑥대처럼 만리를 떠돌리라.
浮雲游子意 落日故人情.
뜬구름은 길 떠난 그대 마음이요, 情지는 해는 친구의 정이라오.
揮手自茲去 蕭蕭班馬鳴.
손 흔들며 여기서 떠나니, 떠나는 말들도 히히힝 우는구려.
2.通釋
〈그대와 이별하는 자리에 오니〉 靑山은 북쪽 성곽을 따라 길게 뻗어 비껴 있고, 白水는 동쪽 성 아래를 빙 돌아 흘러가고 있다.
여기 이 땅에서 그대와 한번 헤어지면 그대는 바람에 날아다니는 쑥대처럼 떠돌겠구려.
하늘의 뜬구름은 정처 없이 길 떠나는 그대의 마음이요, 지는 해는 친구인 나의 애틋한 정이라오.
서로 손을 흔들며 여기서 떠나자 헤어져 가는 말들이 먼저 이별을 알고 길게 울어 더욱 떠나는 느낌을 갖게 하는구려.
[解題]
李白 연구자에 따르면 이 시는 李白의 다른 작품인 〈南陽送客〉과 같은 시기에 쓰인 것으로 추정해 저작시기를 開元 26년(738년) 李白의 나이 38세 때로 보고 있으며, 아울러 시 해석에도 이견이 있다.
‘送友人’이란 제목이 후대에 함부로 붙여진 것으로 보고, 이 시는 오히려 李白이 친구들을 두고 떠나면서 지은 시[別友人]로 읽기도 한다.
安旗主 編 《李白全集編年注釋》에 따르면, 이 시는 李白이 萬里 여행길에 나서며 쓴 작품으로 여행길은 바로 江淮 지역으로 간 것을 말한다고 풀이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해석을 따랐다.
시 가운데 ‘浮雲游子意 落日故人情’은 인구에 회자되는 명구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落日故人情’은 지는 해를 붙잡을 수 없듯 떠나는 친구를 만류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보기도 한다.
3.解題
4.集評
○ 太白詩 浮雲游子意 落日故人情 對景懷人 意味深永
李白의 시구 ‘뜬구름은 길 떠난 그대 마음이요, 지는 해는 친구의 정이라오.[浮雲游子意 落日故人情]’는 경치를 보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의미가 깊고 오래간다.
少陵詩 寒空巫峽曙 落日渭陽情 亦是寫景贈別 而語意淺短
杜甫의 시구 ‘차가운 하늘 무협에 날이 밝았는데 지는 해는 위양의 정이라오.(注7)[寒空巫峽曙 落日渭陽情]’도 경치를 묘사하면서 이별의 말을 부친 것인데 말뜻이 얕고 짧다.
杜詩佳處固多 此等句法却不如李 - 淸 仇兆鰲, 《杜詩詳注》
杜甫의 시에는 아름다운 곳이 참으로 많은데 이런 구절의 언어구사는 도리어 李白만 못하다.
○ 蘇李贈言多唏噓語而無蹶蹙聲 知古人之意在不盡矣 太白猶不失斯旨 - 淸 沈德潛, 《唐詩別裁集》 卷10
蘇武와 李陵이 이별할 때 준 말은 한탄하는 말은 많지만 부자연스러운 소리는 없어 옛사람들의 뜻이 〈말을〉 다하지 않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李白도 이러한 뜻을 잃지 않고 있다.
○ 這詩典型的唐律
이 시는 전형적인 당나라 律詩이다.
李白詩才奔放 適宜于縱橫錯落的歌行句法
李白은 詩才가 분방해서 종횡으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歌行體에 적합하다.
碰上律詩 就象野馬被羈 只好俯首就範
율시를 만나면 야생마가 굴레에 매여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규범에 따르는 것과 같다.
這首詩是他的謹嚴之作 風格已逼近杜甫了 - 現代 施蟄存, 《唐詩百話》 236頁
이 시는 그의 근엄한 작품으로 풍격이 벌써 杜甫에 아주 가깝다.
5.譯註
▶ 靑山 : 낙양 남쪽에 있는 南陽 서북쪽의 精山으로 보기도 한다.
▶ 白水 : 南陽 동쪽의 淯水로 보기도 한다. 淯水의 俗名이 白河이다.
▶ 一 : 강조를 나타내는 조사로 보기도 하는데, 아래 구절의 ‘萬’과 對句이므로 그에 맞추어 ‘한번’이라고 해석하였다.
▶ 孤蓬 : 외로운 쑥대를 말한다. 쑥은 말라 뿌리가 끊어지면 바람 따라 날아다닌다 해서 飛蓬으로도 불리는데, 옛 시가에서 먼 길 다니는 고독한 나그네를 비유하는 말로 항상 쓰였다.
▶ 故人 : 李白 자신을 가리킨다.
▶ 蕭蕭班馬 : 蕭蕭는 말이 우는 소리이다. 떠나가는 말을 말한다. ‘班’은 떠나다[別]라는 뜻이다. 《春秋左傳》 襄公 18년에 “무리를 떠나는 말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 제나라 군사가 도망친 것 같습니다.[有班馬之聲 齊師其遁]”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杜預는 주석에서 “班은 떠나간다[別]는 뜻이다.[班 別也]”라고 하였다. 무리를 떠나는 말을 班馬라고 한다.
▶ 차가운……정이라오 : 杜甫의 시 〈강릉으로 돌아가는 卿二翁 統節度鎭軍을 보내며[奉送卿二翁統節度鎭軍還江陵]〉에 나오는 구절이다. 仇兆鰲는 인용구절의 注에 ‘동이 트고 저녁이 되면서 이별을 아쉬워하는 정이 더욱 깊어진다.[自曙而夕 惜別情深]’라고 하였다.
6.引用
이 자료는 동양고전종합DB http://db.cyberseodang.or.kr/front/main/main.do 에서 인용하였습니다. 耽古樓主.
'漢詩와 漢文 > 당시300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04.夜泊牛渚懷古〈야박우도회고〉-李白(이백) (0) | 2023.11.19 |
|---|---|
| 103.聽蜀僧濬彈琴〈청촉승준탄금〉-李白(이백) (0) | 2023.11.19 |
| 101.渡荊門送別〈도형문송별〉-李白(이백) (0) | 2023.11.19 |
| 100.贈孟浩然〈증맹호연〉-李白(이백) (0) | 2023.11.19 |
| 99.寄左省杜拾遺〈기좌성두습유〉-岑參(잠삼) (0) | 2023.1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