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104.夜泊牛渚懷古〈야박우도회고〉-李白(이백)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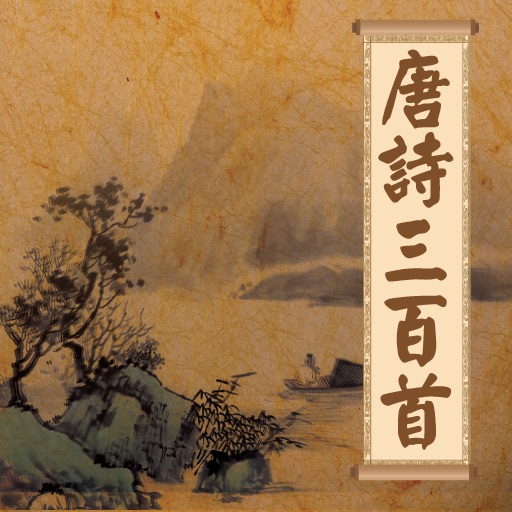
1.題目 作者 原文 解釋
| 夜泊牛渚懷古〈밤에 牛渚에서 정박하며 옛일을 회고하다〉 -李白(이백) |
牛渚西江夜 靑天無片雲.
우저산 밑 西江의 밤 푸른 하늘엔 구름 한 점 없네.
登舟望秋月 空憶謝將軍.
배에 올라 가을 달을 바라보며, 부질없이 謝장군을 생각하누나.
余亦能高詠 斯人不可聞.
나도 시 지어 높이 읊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라.
明朝挂帆席 楓葉落紛紛.
내일 아침 돛을 달고 떠나는 길엔, 단풍잎만 어지러이 떨어지겠지.
2.通釋
배를 우저산 아래 西江 가에 정박시키고 밤을 지내니, 하늘은 조각구름 한 점 없이 파랗다.
나는 배 위에서 둥근 가을 달을 바라보며, 재주 있는 사람을 아꼈던 謝尙 장군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부질없이 생각한다.
나도 좋은 시를 지어 袁宏처럼 맑고 높은 소리로 읊을 수 있건만, 지금은 나의 시를 알아줄 사상과 같은 사람이 없어 안타깝기만 하다.
내일 아침 바람 따라 돛을 펼치고 길을 떠날 것이니, 떠난 자리엔 단풍잎들만 어지러이 떨어질 것이다.
3.解題
이 시는 懷古詩인데, 李白이 청년 시절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전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李白은 이 시를 통하여 자신의 懷才不遇와 그로 인한 가슴속의 울분을 말하고 있다.
처음의 두 구는 경치를 그린 것으로, 밤에 牛渚山 아래 강가에 정박함을 드러냈다.
중간의 네 구는 謝尙 장군을 묘사하였는데, 그처럼 賢才를 발탁해서 등용하는 사람이 지금은 없는 까닭에 한없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말하였다.
마지막 두 구에서는 장차 돛을 올리고 떠나가리라 하였는데, ‘楓葉落紛紛’은 가을 풍경의 묘사이면서, 동시에 李白 자신의 쓸쓸한 심사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4.集評
○ 律詩有徹首尾不對者
율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對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
盛唐諸公有此體
盛唐의 여러 시인들이 이런 詩體를 썼다.
如孟浩然詩 挂席東南望……
예를 들면, 孟浩然의 시 ‘돛 달고 동남쪽 바라보니, 靑山은 水國에서 멀리 있네. 배들은 물결 따라 서로 빨리 건너려 하고, 오고 가는 것 바람과 조수에 맡기네. 지금 어디로 가느냐고 내게 묻는가, 天台山에서 石橋를 찾아가려네. 저물녘 노을빛을 앉아서 보니, 赤城山이 아닌가 의심스럽네.[挂席東南望 青山水國遥 舳艫爭利渉 來往任風潮 問我今何適 天台訪石橋 坐看霞色晩 疑是赤城標]’(《孟浩然集》 卷3, 〈舟中晩望〉)라든가,
又水國無邊際之篇
……또 ‘水國은 끝없이 펼쳐져 있고, 배는 바람 따라 간다네. 그대가 부럽소 이곳을 떠나, 조만간 고향을 볼 테니. 나도 집 떠난 지 오래인데, 그대와 같이 남쪽으로 못 가는 것 한스럽구려. 소식을 만약 묻거든, 강 위에서 만났다고 전해주시오.[水國無邊際 舟行共使風 羨君從此去 朝夕見鄉中 余亦離家久 南歸恨不同 音書若有問 江上㑹相逢]’(《孟浩然集》 卷4, 〈洛下送奚三還揚州〉) 같은 시,
又太白牛渚西江夜之篇 皆文從字順 音韻鏗鏘 八句皆無對偶 - 宋 嚴羽, 《滄浪詩話》
또 李太白의 ‘牛渚西江夜’ 시의 경우 모두 文字는 순조롭고 音韻은 맑은 소리를 내지만, 여덟 구 모두 對偶가 없다.
○ 盛唐人古律有兩種 其一純乎律調而通體不對者 如太白牛渚西江夜……是也 - 淸 陳僅, 《竹林答問》
盛唐 시인들의 古律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그 하나는 律調가 純正하면서도 전체는 對가 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태백의 ‘牛渚西江夜……’와 같은 것이 그렇다.
○ 不用對偶 一氣旋折 律詩中有此一格 - 淸 沈德潛, 《唐詩別裁集》
對偶를 쓰지 않고 하나의 기세로 굽이굽이 펼쳐 나갔으니, 율시 중에 이것도 하나의 體格이다.
○ 或問不著一字盡得風流之說
어떤 이가 “한 글자도 덧붙이지 않고 풍류를 다 얻었다.”는 설에 대해 묻자 내가 답하였다.
答曰 太白詩牛渚西江夜……楓葉落紛紛
“이태백의 ‘牛渚西江夜……楓葉落紛紛’이라는 시가 그렇다.
詩至此 色相俱空 正如羚羊挂角 無迹可求
시가 여기에 이르면 色相이 모두 텅 비어 마치 영양이 뿔을 걸어놓은 것과 같아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畵家所謂逸品是也 - 淸 王士禎, 《帶經堂詩話》
畵家들이 말하는 소위 逸品이란 이런 것이다.”
○ 白天才超邁 絶去町畦
李白은 타고난 재주가 超邁하여 法度를 훌쩍 뛰어넘었다.
其論詩以興寄爲主 而不屑屑于排偶聲調 當其意合 眞能化盡筆墨之迹……
그의 시를 논한다면 興을 부치는 것을 主로 삼았고 對偶와 聲調를 배열하는 것은 달가워하지 않았으며, 뜻에 합하는 것을 만나면 진실로 筆墨의 흔적을 다 변화시킬 수 있었다.
司空圖云 不著一字 盡得風流 嚴羽云 鏡中之花 水中之月 羚羊挂角 無迹可求
司空圖는 “한 글자도 덧붙이지 않고 풍류를 다 얻었다.” 하였고, 嚴羽는 “거울 속의 꽃처럼, 물속의 달처럼, 영양이 뿔을 걸어놓은 듯이,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論者以此詩及孟浩然望廬山一篇當之 盖有以窺其妙矣
논자들은 이 시와 孟浩然의 〈望廬山〉 한 편이 그에 해당한다고 하니, 그 오묘함을 엿본 것이다.
羽又云 味在酸醎之外 吟此數過 知其善于名狀矣 - 淸 弘歷, 《唐宋詩醇》
엄우는 또 말하기를 “맛이 시고 짠 것 밖에 있다.” 하였으니, 이 시를 여러 번 읊조려보면 그 형상을 표현한 것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律不取對 如李白 牛渚西江夜 云云 孟浩然 挂席東南望 云云
○ 律詩 중에 對를 취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예를 들면 李白의 ‘牛渚西江夜……’와 孟浩然의 ‘挂席東南望……’이다.
二詩無一句屬對 而調則無一定不律
두 시는 한 구절도 對句로 지은 것이 없지만, 聲調는 하나도 律詩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
故調律則律 屬對非律也 - 淸 王琦注引趙宦先, 《李太白文集》 卷22
그러므로 律調에 있어서는 律詩이지만 對偶를 맞추는 것에 있어서는 律詩가 아니다.
○ 律詩不屬對
○ 율시에서 對偶를 맞추지 않은 시가 있다.
唐人律詩 有第三四句 有不屬對者 如李白 牛渚西江夜 崔灝 黃鶴樓詩之類 - 朝鮮 李裕元, 《林下筆記》 卷33 〈華東玉糝編〉 中 〈諸詩體〉
당나라 사람의 율시에는 제3‧4구에 대우를 맞추지 않은 것이 있으니, 이를테면 李白의 ‘牛渚西江夜’나 崔灝의 ‘黃鶴樓’와 같은 부류이다.
5.譯註
▶ 牛渚 : 《元和郡縣志》 〈江南宣州當塗縣〉 條에 “牛渚山은 縣의 북쪽 35리 되는 곳에 있는데, 산이 강 가운데 우뚝 솟아 있어 牛渚磯라고 한다. 나루터가 있는 곳이다.[牛渚山 在縣北三十五里 山突出江中 謂之牛渚磯 津渡處也]”라고 되어 있다. 전하는 말에 李白이 술에 취하여 강물 속의 달을 잡으려다 강물에 빠졌는데, 그 장소가 이곳이라고 한다. 采石磯로도 불린다. 이 시의 제목 아래 原註에 “이곳이 바로 謝尙이, 袁宏의 〈詠史〉 시를 들었던 곳이다.[此地卽謝尙聞袁宏詠史處]”라고 하였다. 《晉書》 〈謝尙傳〉과 〈袁宏傳〉에 의하면, 사상은 字가 仁祖이고 관직은 鎭西將軍에 이르렀다. 원굉은 字가 彦伯인데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었고 가난하였다. 사상이 牛渚를 지키고 있을 적에, 가을밤 微服을 하고 屬官들과 함께 강 위에 배를 띄워 달을 감상하고 있는데 때마침 원굉이 멀리 運糧船 위에서 자작시인 〈詠史〉를 읊는 것이었다. 그 소리가 淸朗하고 詩語 또한 아름다워 사상의 격찬을 받았는데, 이로부터 원굉의 명성이 날로 드높아져 훗날 관직이 東陽太守에 이르렀다.
▶ 西江 : 江西省에서 南京에 이르기까지의 長江을 옛날에 西江이라 불렀는데, 牛渚山은 이 西江邊에 있다.
▶ 謝將軍 : 謝尙을 가리킨다.
▶ 斯人 : 謝尙을 가리킨다.
▶ 挂帆席 : 바람을 따라 돛을 펼친 것을 말한다. 《全唐詩》 校註에 “어떤 본에는 洞庭去라 하였고, 또 다른 본에는 挂帆去라 하였다.[一作洞庭去 一作挂帆去]”고 되어 있다.
▶ 한 글자도……얻었다 : 이것은 司空圖의 〈二十四詩品〉 가운데 ‘含蓄’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때 ‘著’은 ‘粘著’의 뜻으로, 한 글자도 덧붙이지 않고 이미 풍류의 정취를 다 얻었음을 말한다.
▶ 영양이 뿔을 걸어놓은 것 : 羚羊은 밤에 잘 때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해 뿔을 나무에 걸어두고 발을 땅에 붙이지 않기 때문에, 그 발자국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이는 宋나라 嚴羽의 《滄浪詩話》 〈詩辯〉에 나오는 말로, 당나라 시인들의 시가 興趣에 주력하여 인위적인 흔적이 없이 자연스레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望廬山〉 : 原題는 〈彭蠡湖中望廬山〉인데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太虛生月暈 舟中知天風 挂席候明發 渺漫平湖中 中流見匡阜 勢壓九江雄 黯黮凝黛色 崢嶸當曙空 香爐初上日 瀑水噴成虹 久欲追尙子 況玆懷遠公 我來限于役 未暇息微躬 淮海途將半 星霜歲欲窮 寄言嵓棲者 畢趣當來同”
6.引用
이 자료는 동양고전종합DB http://db.cyberseodang.or.kr/front/main/main.do 에서 인용하였습니다. 耽古樓主.
'漢詩와 漢文 > 당시300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06.春望〈춘망〉-杜甫(두보) (1) | 2023.11.20 |
|---|---|
| 105.月夜〈월야〉-杜甫(두보) (1) | 2023.11.19 |
| 103.聽蜀僧濬彈琴〈청촉승준탄금〉-李白(이백) (0) | 2023.11.19 |
| 102.送友人〈송우인〉-李白(이백) (2) | 2023.11.19 |
| 101.渡荊門送別〈도형문송별〉-李白(이백) (0) | 2023.1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