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태평한화골계전14-借鷄騎還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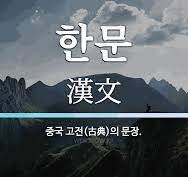
太平閑話滑稽傳
借鷄騎還
一金先生者 善談笑.
金先生이라는 사람이 우스갯소리를 잘했다.
嘗訪友人家 主人設酌 只佐蔬菜.
일찍이 친구의 집을 찾아갔더니, 주인이 술상을 차렸는데 안주가 단지 채소뿐이었다.
先謝曰
「家貧市遠 絶無美味 惟淡泊是愧耳.」
주인이 먼저 사과하였다.
"집안이 가난하고 시장이 멀어서, 먹을 만한 것은 없고 오직 덤덤하니, 이것이 부끄러울 뿐이네"
▶惟 A 是 B: 오직 A 만을 B한다.
▶惟淡泊是愧耳: 오직 담박하기만 한 것을 부끄러워할 뿐이다. =惟愧淡泊.
適有群鷄 亂啄庭除.
그때 마침 뭇 닭들이 마당에서 어지럽게 쪼고 있었다.
▶庭除: 뜰.
金曰
「大丈夫不惜千金 當斬吾馬 佐酒.」
金이 말하였다
"대장부는 千金을 아끼지 않나니, 내 말을 잡아서 술안주를 해야겠네"
主人曰
「斬一馬騎何物而還?」
주인이 말하였다
"마리뿐인 말을 잡아 버리면 무엇을 타고 돌아가겠나?"
金曰
「借鷄騎還.」
김이 말하였다.
"닭을 빌려서 타고 돌아가지"
主人大笑 殺鷄餉之 仍與大噱.
주인이 크게 웃고 닭을 잡아 대접하고는 둘이서 크게 웃었다.
▶ 太平閑話滑稽傳
정의
조선전기 문신·학자 서거정이 해학적 일화를 수록하여 편찬한 설화집.
내용
일반적으로 ‘골계전’이라고 한다. 앞 부분에는 편자의 자서와 양성지(梁誠之)·강희맹(姜希孟)의 서문이 있는데, 편찬의 동기 및 과정, 골계전적인 소화(笑話)의 효용성과 의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현존하는 원본은 없고 네 종류의 이본이 전하는데, 1959년 민속자료간행회에서 유인본으로 출간한 『고금소총 古今笑叢』 제2권에 수록된 146화(話), 일사본(一簑本) 『골계전』(유인본 고금소총과 같은 내용임.), 정병욱가(鄭炳昱家) 소장본의 110화, 일본의 이마니시문고본(今西文庫本)의 187화가 있다.
『골계전』은 한문으로 편집된 해학적 이야기책이므로 일종의 문헌 설화로 간주되며, 소화로서의 민담의 성질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유인본 『고금소총』에 수록된 『골계전』 제1권의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탐관과 승려의 대화, 정삼봉(鄭三峰)·이도은(李陶隱)·권양촌(權陽村)이 벌인 평생의 자락처(自樂處)가 어디인가에 대한 논란, 말재주가 좋은 승려와 말 잘하는 향인 최양희(崔揚喜)의 대화, 호주가 끼리의 음주 시합(부마와 태수) 등으로, 이상은 첫머리에 나오는 것을 순서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편차의 순서나 편집상의 분류 의식은 전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편집 방법은 모든 소화집의 공통점이라 여겨진다.
또한, 이 소화집에는 이야기의 제목도 없으며 짤막짤막한 이야기를 연편식(連篇式)으로 이어간다. 위의 예에서 볼 때, 꾸며낸 옛말이라기보다 실화에 가까운 것이 많다는 점과,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골계전』에서는 역사적 인물의 일화가 단연 우세해 수록 작품의 3분의 1이 유명 인물의 일화이고 그 나머지도 거의 유자(儒者)들의 이야기인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도 그 내용이 풍성하니, 위의 예에서도 탐관 오리와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학자·관료를 중심으로 향인, 서당 선생, 승려, 기생 등 각층의 인물이 고루 등장한다.
이 가운데 정수는 조영암(趙靈巖) 번역본의 『고금소총』에 발췌된 13화다.
'漢詩와 漢文 > 太平閑話滑稽傳'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태평한화골계전16-德哉使酒 (0) | 2024.11.16 |
|---|---|
| 태평한화골계전15-貪黑之守 (0) | 2024.11.15 |
| 태평한화골계전13-使道爲馬 (5) | 2024.11.14 |
| 태평한화골계전12-吾事去矣 (4) | 2024.11.14 |
| 태평한화골계전11-風馬 (1) | 2024.1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