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142.酬程延秋夜卽事見贈〈수정연추야즉사견증〉-韓翃(한굉)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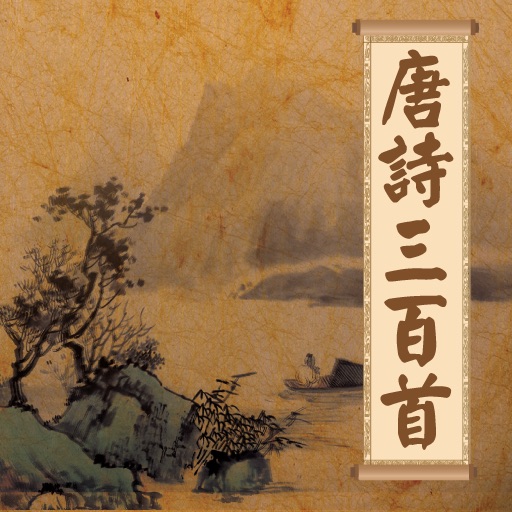
1.題目 作者 原文 解釋
| 酬程延秋夜卽事見贈〈程延의 秋夜卽事를 받고 화답하다〉 -韓翃(한굉) |
長簟迎風早 空城澹月華.
긴 대나무 이른 바람을 맞이하고 텅 빈 성엔 달빛이 고요하다.
星河秋一雁 砧杵夜千家.
가을 하늘 은하수에 기러기 한 마리 한밤엔 온 마을 다듬이 소리.
節候看應晩 心期臥亦賖.
계절을 헤아려보니 응당 늦었건만 마음속 기약에 잠자리 드는 것도 더디구나.
向來吟秀句 不覺已鳴鴉.
줄곧 빼어난 구절 읊다가 벌써 까마귀 운 것도 깨닫지 못했네.
2.通釋
가을 하늘에는 은하수 보이는데 기러기 한 마리 날아가고, 밤이 깊어지면서 온 마을엔 다듬이 소리만 들린다.
계절을 헤아려보니 늦가을, 잠자리에 들어야 하건만 벗에게 받은 시에 화답해야지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룬다.
밤새 벗이 보내준 훌륭한 시구만을 계속 읊다가 날이 밝아 벌써 까마귀가 운 것도 모르고 있었다.
3.解題
이 작품은 和答詩로 전반부는 시 제목을 풀이하고 후반부는 酬唱을 나타낸다.
가을밤의 정취를 묘사하면서 제3구에는 ‘秋’字를, 제4구에는 ‘夜’字를 넣어 교묘하게 破題하며 詩語를 운용하였다.
4.集評
○ 唐詩評韓翃詩謂 比興深於劉長卿 筋節成於皇甫苒 - 明 楊愼, 《升菴詩話》
唐詩 가운데 韓翃의 시를 평해, 比와 興은 劉長卿보다 깊이가 있고 시어의 연결과 節奏는 皇甫苒보다 원숙하다고 했다.
○ 君平意氣淸華 才情俱秀 - 明 徐獻忠, 《唐詩品》
君平(韓翃)은 意氣가 맑고 아름다우며 재주와 정감이 모두 빼어나다.
○ 韓君平詩不過秀句 足供諷詠 流傳不泯 篇法宛轉諧適而已 - 淸 方東樹, 《昭昧詹言》
韓君平 시의 몇 개에 지나지 않는 훌륭한 구절은 諷詠을 잘해서 후세에 전해져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작법이 매끄럽고 말이 조화를 이루어 딱 맞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 秋夜二字 極尋常 一經爐錘 便成詩眼 - 淸 査愼行, 《初白庵詩評》
‘秋’, ‘夜’ 두 글자는 아주 심상한 글자인데 한 번 단련을 거치자 詩眼이 되었다.
5.譯註
▶ 程延 : 程近으로 되어 있는 本도 있다. 生平은 미상이다.
▶ 韓翃 : 생몰년 미상. 字는 君平, 南陽人이다. 中書舍人 등을 역임했다. 錢起, 盧綸 등과 함께 大曆十才子로 꼽힌다.
▶ 長簟迎風早 : ‘簟’은 대나무로 짠 자리이기도 하고 대나무의 한 종류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대나무 가지로 보았다. ‘早’는 초저녁으로 볼 수도 있다. 시인이 대나무로 짠 자리에 앉아 초저녁에 바람을 맞이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 星河 : 은하수를 가리킨다.
▶ 砧杵 : 문자 그대로 풀면 다듬잇돌과 다듬잇방망이를 말하지만 앞 구절의 시각적 이미지와 대를 맞춰 다듬이 소리로 풀었다.
▶ 心期臥亦賖 : ‘心期’는 마음으로 기약하다는 말로 기약은 시에 화답하는 것을 말한다. ‘賖’는 ‘늦다, 더디다’라는 뜻이다.
▶ 向來吟秀句 : ‘向來’는 ‘이전부터 지금까지’라는 뜻이다. ‘秀句’(빼어난 구절)는 상대방의 시를 가리킨다.
▶ 鳴鴉 : 날 밝을 때 들려오는 까마귀 소리를 가리킨다.
6.引用
이 자료는 동양고전종합DB http://db.cyberseodang.or.kr/front/main/main.do 에서 인용하였습니다. 耽古樓主.
'漢詩와 漢文 > 당시300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44.客舍與故人偶集〈객사여고인우집〉-戴叔倫(대숙륜) (1) | 2023.11.25 |
|---|---|
| 143.闕題〈궐제〉-劉眘虛(유신허) (0) | 2023.11.25 |
| 141.賦得暮雨送李冑〈부득모우송이주〉-韋應物(위응물) (0) | 2023.11.25 |
| 140.淮上喜會梁川故人〈회상희회양천고인〉-韋應物(위응물) (0) | 2023.11.25 |
| 139.谷口書齋 寄楊補闕〈곡구서재 기양보궐〉-錢起(전기) (0) | 2023.1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