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132.早寒江上有懷〈조한 강상유회〉-孟浩然(맹호연)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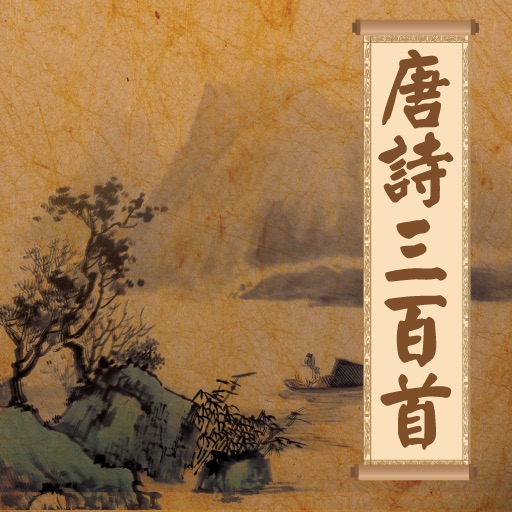
1.題目 作者 原文 解釋
| 早寒 江上有懷〈새벽 추위에 강가에서 감회가 생겨〉 -孟浩然(맹호연) |
木落雁南渡 北風江上寒.
낙엽지고 기러기 남쪽으로 건너가는 때 북풍이 불어 강가 차갑구나.
我家襄水曲 遙隔楚雲端.
내 집은 襄水 굽이 멀리 초나라 구름 너머에 있네.
鄕淚客中盡 孤帆天際看.
고향 그리는 눈물 나그네 길에 다 말랐는데 하늘가 외로운 배만 보이네.
迷津欲有問 平海夕漫漫.
나루를 못 찾아 묻고자 하나 바다 같은 강물 날 저물어 아득하기만 하네.
2.通釋
나뭇잎 떨어지고 기러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날아가는 가을, 북풍도 함께 불어오니 강이 차가와졌다.
내 고향 집은 저 북쪽 襄水가 굽이쳐 흐르는 곳인데 멀리 옛날 초나라가 있던 땅 높고 험한 곳에 있구나.
오랫동안 나그네로 객지에서 지내다 보니 고향 그리워 흘리는 눈물조차 다 말랐는지 외로운 돛단배 한 척이 수평선 너머 하늘 끝으로 들어가는 모습만 눈에 들어온다.
나루가 어디 있는지 한참 헤매다 누구에겐가 묻고 싶은데, 잔잔한 강물은 광활하여 저녁이 되고 어둠이 내리면서 더 아득해지기만 한다.
3.解題
이 시는 작가의 末年, 長安을 떠나 江南 각지를 周遊하던 시기에 고향을 그리워하며 쓴 작품으로 보기도 하고, 東南 각지를 다니다가 마지막에 長安으로 가서 進士試에 응시한 때의 작품으로 보아 40세 이전에 쓴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40세 이전 작품으로 보는 근거는 ‘迷津欲有問’의 典故, 공자와 長沮‧桀溺의 충돌을 맹호연의 심리적 갈등으로 파악한 데에 있다.
공자로 대표되는 정치에 대한 意志와 隱者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갈등이 아직 시인의 삶 속에서 정리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이 구절을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시인은 평생 동안 갈등 속에 있었으므로 40세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라 하여 저작시기를 미정으로 남겨두는 의견이 우세하다.
‘襄水曲’과 ‘楚雲端’이 對가 되는데 작가가 지금 楚나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고향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연에서 아득한 강만을 말함으로써 思鄕의 절실한 감정과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을 말뜻 밖에 나타냈다.
4.集評
○ 木落雁南渡 北風江上寒 起手須得此高致 - 淸 沈德潛, 《唐詩別裁集》 卷9
‘木落雁南渡 北風江上寒’이라 했으니, 시를 시작하는 손길은 이런 맑고 드높은 雅致를 터득해야 한다.
○ 末句從早寒說到漫漫永夕 則竟日之低徊不置 自在言外 - 現代 兪陛雲, 《詩境淺說》
마지막 구절은 이른 아침 추위에서부터 길고 아득한 밤까지 말하고 있으니, 하루가 다하도록 방황하며 어쩌지 못하는 모습이 저절로 말뜻 밖에 있다.
5.譯註
▶ 早寒江上有懷 : 제목이 ‘早寒有懷’ 혹은 ‘江上思歸’로 되어 있는 본도 있다.
▶ 木落雁南渡 : ‘木落’은 가을이 되었음을 알려준다. 漢 武帝의 〈秋風辭〉에 “가을 바람 일고 흰 구름 나니 초목은 누렇게 떨어지고 기러기는 남쪽으로 돌아가는구나.[秋風起兮白雲飛 草木黃落兮雁南歸]”라고 하였으니, ‘木落’이 오래 전부터 쓰였음을 알 수 있다. ‘南’이 初로 되어 있는 본도 있으며, 어떤 본에는 ‘渡’가 度로 되어 있기도 하다.
▶ 襄水曲 : ‘襄’이 湘으로, 혹은 江으로 되어 있는 본도 있으며, ‘曲’이 上으로 되어 있는 본도 있다. ‘襄水’는 襄河라고도 하며 襄陽을 경유해 흐르는 漢水의 지류를 말한다. 이 강 언덕 굽이에 맹호연의 집이 있었다.
▶ 楚雲端 : ‘雲’이 山으로 되어 있는 본도 있다. 襄陽은 옛날 楚나라에 속했고 地勢가 높아 ‘楚雲端’이라 표현한 것이다. 지세가 높음을 표현하면서 望鄕의 정을 담고 있다. ‘望’에는 바라볼 수는 있어도 갈 수는 없는 심정을 담고 있다.
▶ 鄕淚客中盡 : ‘鄕淚’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흘리는 눈물을 말한다. ‘客中盡’은 나그네 생활을 오래 했음을 드러낸다.
▶ 孤帆天際看 : ‘孤’가 歸로, ‘際’가 外로 되어 있는 본도 있다. ‘看’의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시의 의미가 달라진다. 시인이 주체일 경우 ‘외로운 돛배 같은 자신의 신세를 바라본다.’라고 풀 수 있고, 시인의 가족이 주체일 경우 ‘天際’, 즉 襄陽에서 맹호연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로 풀 수도 있다. ‘孤’가 歸로 쓰인 경우 가족의 시선이 명확해진다.
▶ 迷津欲有問 : 《論語》 〈微子〉편에 “長沮‧桀溺이 함께 밭을 갈고 있었는데 공자께서 지나다가 자로를 시켜 그들에게 나루를 묻게 하셨다.[長沮桀溺耦而耕 孔子過之 使子路問津焉]”는 전거를 쓴 것이다.
▶ 平海夕漫漫 : ‘平海’는 물결이 잔잔해 넓어 보여 바다 같다는 말이며, ‘漫漫’은 끝없이 광활한 모양이다. ‘漫漫’을 ‘夕’을 형용하는 말로 보아 밤이 깊어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혹은 막막하다, 멍하다는 뜻으로 보아 저 물결 헤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심정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도 한다.
6.引用
이 자료는 동양고전종합DB http://db.cyberseodang.or.kr/front/main/main.do 에서 인용하였습니다. 耽古樓主.
'漢詩와 漢文 > 당시300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34.送李中丞歸漢陽別業〈송이중승귀한양별업〉-劉長卿(유장경) (1) | 2023.11.24 |
|---|---|
| 133.秋日登吳公臺上寺遠眺〈추일등오공대상사원조〉-劉長卿(유장경) (1) | 2023.11.24 |
| 131.留別王維〈유별왕유〉-孟浩然(맹호연) (2) | 2023.11.24 |
| 130.宿桐廬江 寄廣陵舊游〈숙동려강기광릉구유〉-孟浩然(맹호연) (0) | 2023.11.24 |
| 129.秦中寄遠上人〈진중기원상인〉-孟浩然(맹호연) (1) | 2023.11.24 |





